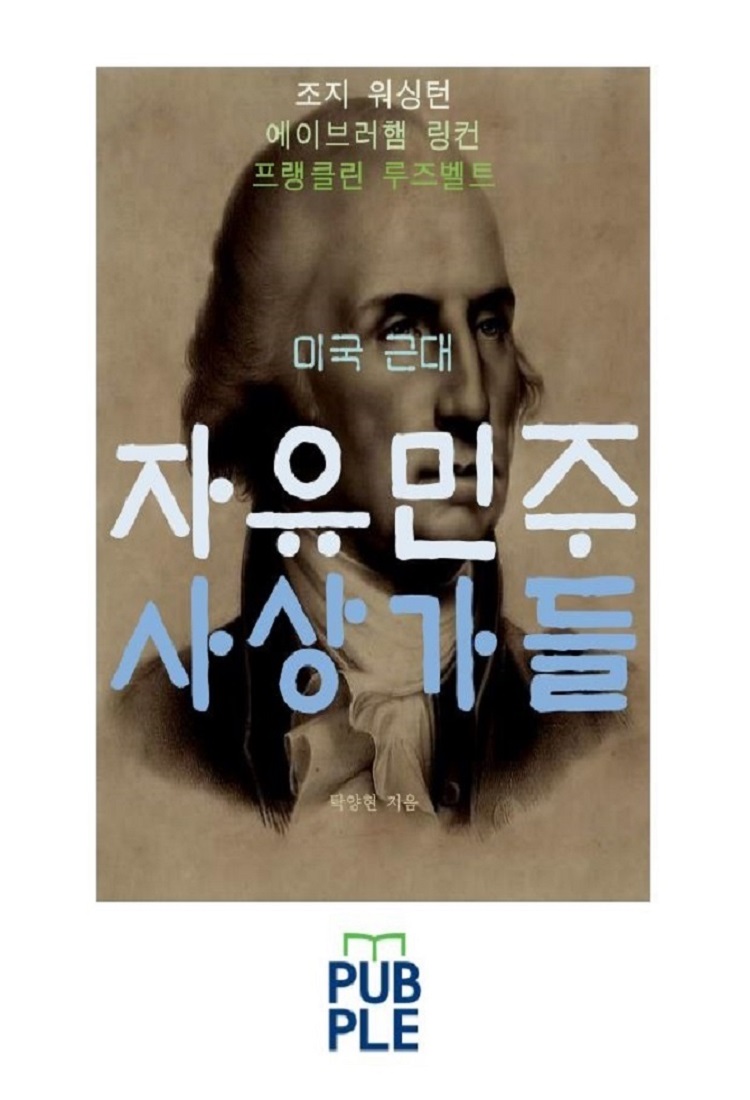일단 ‘사유방식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국가공동체는 물론이며 서민대중은, ‘생존의 이득’을 위해 시쳇말로 ‘알아서 기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사대주의 프레임’은, 조선왕조 시기에 본격적으로 固着化되었다. 그 역사적 사례로서, ‘鄭道傳’의 ‘朝鮮經國典 國號’ 편을 살펴볼 수 있다.
鄭道傳은 조선왕조의 ‘사대주의 프레임’을 설계한 인물이다. 그의 ‘사유방식 프레임’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역사적 慣性이라는 것은, 어떤 격변에 의해 일단 정지되더라도, 한참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니 한동안 ‘사대주의 프레임’은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조선경국전 국호’ 편의 내용이다.
“국가의 칭호[國號].
현재에 이르도록 해동지국은, 그 국호가 일정하지 않았다.[海東之國, 不一其號.]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중국의 바다 건너 해동에 있는 국가를 조선이라고 일컬은 자가 셋 있었다.[爲朝鮮者三.] ‘단군’이 그렇게 말했고, ‘기자’가 그렇게 말했으며, ‘위만’이 그렇게 말했다.[曰檀君, 曰箕子, 曰衛滿.]
한반도의 남쪽에서 박씨와 석씨와 김씨는, 서로 이어가면서 신라라고 일컬었다.[若朴氏昔氏金氏, 相繼稱新羅.] 한반도의 남쪽에서 온조는, 신라보다 앞서 백제라고 일컬었다.[溫祚, 稱百濟於前.] 견훤은, 뒤에 이를 이어 후백제라고 일컬었다.[甄萱, 稱百濟於後.]
또한 한반도의 북쪽에서 고주몽은, 고구려라고 일컬었다.[又高朱蒙, 稱高句麗]. 궁예는, 후고려라고 일컬었다.[弓裔, 稱後高麗.] 왕씨는 궁예를 대신하여서,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王氏代弓裔, 仍襲高麗之號.]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 지역을 몰래 차지한 것에 불과하다.[皆竊據一隅.] 중국 천자의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不受中國之命.] 그리고서는 스스로 마음대로 국호를 정립하고서는, 서로를 침탈하였던 것이다.[自立名號, 互相侵奪.]
이러하니 비록 국호로서 호칭한 바가 있더라도, 어찌 취할 것이 있겠는가?[雖有所稱, 何足取哉?] 오로지 ‘기자’만은, 주나라 무왕의 명령을 받아서, 조선의 제후에 책봉되었다.[惟箕子, 受周武之命, 封朝鮮侯.]
이에 지금의 천자인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은 이렇게 말한다.[今天子命曰] 오직 ‘조선’이라는 칭호가 아름답고, 또한 그 유래가 아득히 오래되었다.[惟朝鮮之稱美, 且其來遠矣.] 이 이름을 조상대대로 사용하며, 하늘의 이치를 체득하여서, 백성을 다스린다면 후손이 길이 창성할 것이다.[可以本其名, 而祖之體天, 牧民永昌後嗣.]
이는 주나라의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책봉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 전하를 ‘조선의 제후’에 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蓋以武王之命箕子者, 命殿下.] 이러하다면 나라의 이름은 이미 바르고, 그 글자는 이미 순조롭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名旣正矣, 言旣順矣.]
‘기자’는 무왕에게 ‘홍범’으로써 도덕정치의 큰 법칙을 설명하였다.[箕子, 陳武王以洪範.] 나아가 홍범의 뜻을 부연하여, 8조의 법령을 지어서, 나라 안에서 실시하였다.[推衍其義, 作八條之敎, 施之國中.] 이에 정치와 교화가 성하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다워졌다.[政化盛行, 風俗至美.]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천하의 후세에 이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朝鮮之名, 聞於天下後世者如此.] 이제야 우리는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다시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今旣襲朝鮮之美號.] 이에 ‘기자의 선정’을, 또한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則箕子之善政, 亦在所當講焉.]
아! 명나라 천자의 덕이, 주나라 무왕에게 부끄러울 게 없는 것처럼, 우리 전하의 덕, 또한 어찌 기자에게, 부끄러울 것이 있겠는가![嗚呼! 天子之德, 無愧於周武, 殿下之德, 亦豈有愧, 於箕子哉!] 장차 홍범의 학문과, 8조의 법령을, 지금 시대에 다시 시행되게 될 것이다.[將見洪範之學, 八條之敎, 復行於今日也.]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孔子曰.] 나는 어느 나라든 나를 써준다면, 그 나라를 ‘동주’처럼 융성한 나라로 만들겠다.[吾其爲, 東周乎.] 이러하니 공자가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豈欺我哉!]”
여기서 鄭道傳은, 朝鮮王朝가 왜 ‘사대주의 프레임’을 闡明하는지, 그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周나라 武王이 세계의 유일한 天子인데, 그의 冊封을 받아서 朝鮮의 제후가 된 사람이 箕子이므로, 그 ‘箕子朝鮮’만이 정통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사대주의 프레임’을 작동시키기 위해, 본래 朝鮮인 古朝鮮의 역사는 삭제되어야만 했다.
이는, 檀君은 天子을 책봉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조선은, 황하문명(西紀前 5,000)보다 수천 년 앞서는 요하문명(西紀前 8,000)에 토대를 두는, 最古의 문명이다. 그러한 고조선이, 왜 황하문명에서 태동한 주나라 임금의 책봉을 받아야 하는가. 더욱이 당시 고조선은 동아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최강대국이었다.
그래서 ‘기자조선’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그것이 植民史觀이나 東北工程 식의 ‘사대주의 프레임’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도전 식의 ‘사대주의 선언’을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민족에게 전해지는 上古史는, 대부분 삭제된 후 조작되어버린 歷史다. 예컨대, 조선왕조 ‘世祖의 收書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의 上古史는 ‘사대주의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부분 자의적으로 삭제되어버렸다.
이러한 ‘사대주의 프레임’이 500여 년 지속되었고, 日帝强占期에는 暴壓에 의해 새로이 등장한 ‘植民主義 프레임’이 36년 간 지속되었다. 그런데 ‘식민주의 프레임’에 의해 ‘사대주의 프레임’이 代替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다양화된 ‘사대주의 프레임’을 초래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식민주의 프레임’을 잇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전제하므로, ‘사대주의나 식민주의 프레임’에 비해 다소 나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공산주의 프레임’과 ‘주체사상 프레임’에 비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더욱이 표면적으로도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중국과 조선왕조처럼 事大關係가 아니라, 분명히 同盟關係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한국인의 思惟方式은 여전히 ‘사대주의 프레임’이며, 더 나아가 과거 일본을 대하는 식의 ‘식민주의 프레임’이 작동하기 한다.
그러다보니 미국은 전혀 사대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기어야’ 하는 양, 미국을 事大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거대한 착각이며, 오히려 국제관계에서 부작용이나 불이익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미국은, 발바닥이라도 핥겠다며 事大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사대주의 프레임’에서 ‘전쟁주의 프레임’나 ‘자본주의 프레임’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 지나버렸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대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역사적 관성 탓이겠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실로 암울할 따름이다.
서양문명의 역사에서 밝혀지듯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흘리는 전쟁으로써 쟁취되는 것이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가혹한 경쟁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국제정치에서 미국 등의 강대국을 상대하려면, 응당 이에 기반하는 ‘전쟁주의 프레임’과 ‘자본주의 프레임’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 속 강대국들은 이내 戰爭主義者로서 ‘전쟁’이라는 형식을 빌어, 가혹한 資本主義的 폭력을 행사하므로 ‘생존의 이득’은 소멸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이는 클라제비츠의 주장처럼,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므로, 근대 식민 제국주의 이후 국제정치는, 실로 전쟁으로써 국제정치를 실현하는 현장인 탓이다.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 1780~1831)’는, 19세기 초반 프로이센의 장군이자 전쟁이론가이다. 그가 쓴 ‘전쟁론’은 철학, 정치학, 군사학을 아우르는 전쟁이론서로, 동양의 孫子兵法에 비견할 만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른 전서와 비교되는 ‘전쟁론’의 특징은, 전쟁의 본질, 전쟁이론, 전략과 전술, 전투, 군사력과 전쟁계획 등, 전쟁의 諸 요소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철학 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특히 전쟁과 정치의 관계는, 이 책의 중심주제 중 하나인데, 이는 ‘전쟁은, 다른 수단들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유명한 명제로서 요약된다.
“전쟁의 가치는, 정치에 의해 결정되며, 정치는 전쟁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정치와 전쟁의 合目的的 조화를 주장한 클라우제비츠의 사상은, ‘정치를 위해서는, 전쟁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그는, 한동안 ‘폭력의 使徒’라는 오명을 써야만 했다. 전쟁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강조한 그의 사상은, 오히려 현대에 와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근현대의 군사학자는 물론, 혁명가, 정치가, 철학자들에게까지 ‘전쟁론’은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뛰어난 게릴라 전략가와 이론가로 손꼽히는 3인으로서, 영국의 ‘로렌스 대령’,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체 게바라’ 등이, 이 책의 ‘정치와 전쟁’, ‘국민전쟁’ 편을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레닌도, 클라우제비츠의 정치이론을 연구했다.
‘전쟁론’은, 육군대학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818년∼1830년에 집필한 것으로, 그가 사망한 후, 그의 부인 ‘폰 마리’에 의해서 편집된, ‘전쟁과 작전술에 관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장군의 유저집’ 10권 중의 첫 3권으로 되어 있다.
‘전쟁론’은 ‘나폴레옹 1세’의 여러 전쟁을, 자신의 전투 경험과 깊은 통찰을 통해서 정리 분석하여, 전쟁이론을 체계화한 것으로, 1832년 8월 30일에 출간되었다. 전쟁의 본질, 전쟁이론, 전략일반, 전투, 군사력(전투력), 방어, 공격, 전쟁계획의 8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마지막 두 편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 가운데 전쟁의 본질·이론 및 전략의 기본 등, 전쟁철학적 부분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정치(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전쟁본질론은, 특히 유명하다.
또한 오늘날의 전면전쟁과 제한전쟁의 분류개념과 유사하게, 전쟁의 종류에는 적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한 것과, 국경 부근에 있는 적의 영토 일부분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산주의자인 ‘F.엥겔스’나 ‘N.레닌’까지도 ‘전쟁론’을, 군사과학의 고전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인 전쟁이론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1951년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발간된 ‘Clausewitz, Jomini, Schlieffen’이라는 책자에서는, ‘전쟁론’의 철학을 ‘비스마르크’의 鐵血哲學이며, 동시에 히틀러의 이른바 ‘나의 투쟁’ 철학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하튼 이 책은, 출간된 후부터 현재까지, 세계의 수많은 국가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왔고,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국가의 군사교육기관에서, 강의의 교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전쟁론’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무수한 국제정치적 이론이나 논리들은, 그저 ‘우드로 윌슨’의 순진한 理想主義처럼, 상상의 산물일 따름이다. 현재에 이르도록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로써도, 강대국과 약소국의 불평등은 해명되지 않는 탓이다.
그러니 약소국인 조선왕조는, 강대국인 중국을 철저히 事大함으로써, 생존을 도모했다. 그리고 日帝强占期를 맞으면서, 일본을 받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현대의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전제로, 어쨌거나 미국의 편에 서야만 한다.
중국, 일본, 미국 중에서, 어느 강대국이 특별히 좋을 리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 그저 ‘國際政治的 不得已’ 임을 시인해야만 한다. 스스로 國益을 지켜내고, 어떻게든 강대국이 되는 것 말고는, 강대국을 받들어야 하는 현실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아니, 자칫 받들지 않았다가는,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처럼 참으로 진심으로 사대하면 되는 것인가. 필자는 나름의 이유로, 조선왕조의 학문체계를 연구해야만 한다. 그러다보면 조선의 사대부나 선비들이, 假飾이나 僞善이 아니라, 진심으로 ‘朱子學 이데올로기’와 중국문화를 섬겼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단지 생존의 방편으로써, 旣得權을 보장받기 위한 책략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미국 式의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이론 중에서, 주도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朱子學을 신봉했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완벽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이론이 있다면, 응당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근대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의 競合이 있었던 것이다. 그 경합은, 결국에는 가장 극단적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전쟁의 형식으로써 판가름되었다.
직접적인 전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산주의 진영’이 경제적으로 몰락했을 것임은, 역사로써 검증되는 周知의 사실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經濟力은, 과거의 전쟁능력에 버금하는 위력을 지닌다. 그러니 굳이 직접적인 파괴적 전쟁에 의하지 않고, 경제전쟁의 형식으로써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국제질서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현대의 국제사회는 ‘사대주의 프레임’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주의와 자본주의 프레임’에 의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국제관계를 君臣關係 쯤으로나 인식하는 ‘사대주의 프레임’으로써, 그저 道德君子인 양 양보하는 척 하면서, 自己欺瞞的 屈從으로써 국제정치를 대하다가는, 결국 現狀維持도 不可한 몰락을 예견치 않을 수 없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