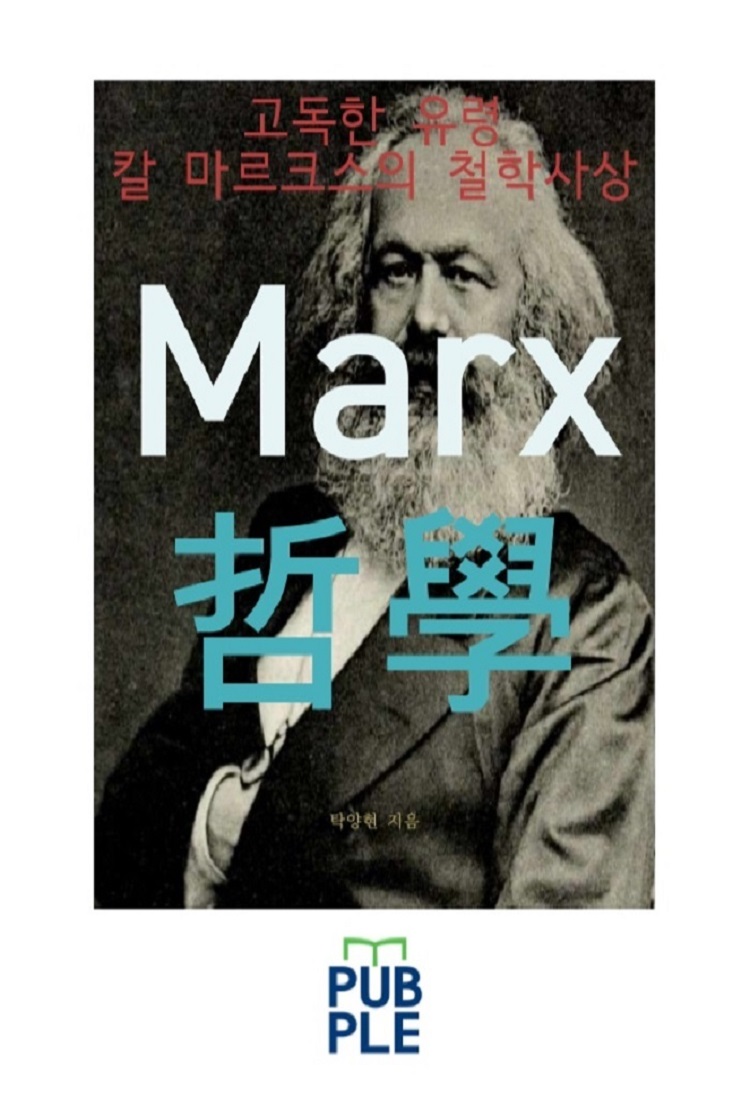▣ 목차
제1장. 맑스철학 일반
제2장. 맑스철학 총론
제3장. 맑스철학 각론
제4장. 고독한 유령
고독한 幽靈, 유령이 떠돌고 있다.
온 세상에, 지독히도 고독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
어느 理想主義者의 强辯처럼, 세상을 온통 집어삼키는 괴물로서, 너무도 거대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것은 마지막 유령이다.
하지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너무도 많은 유령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일견 유령의 떠돎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인류의 역사다.
쉼 없이 얼음이 녹아 흐른다.
백파이프 소리가 아련히 들려온다.
마치 향피리 소리처럼, 끊어질 듯 이어진다.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는다.
실상, 유령은 고독한 피에로다. 아니 고독과 비탄으로 가득한 피에로의 흔적이다.
대부분의 피에로에게, 슬픔 이외의 감정은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슬퍼하지 않는 피에로가 실재한다면, 가장 먼저 그의 피에로로서의 자격은 박탈될 것이다.
그래서 지친 기색이 역력한 피에로의 흔적은, 이미 유령을 닮는다.
그대. 여전히 고뇌하는 자여! 이제 그대는 피에로다. 그렇다. 흔적뿐인 피에로의 유령이다.
아는 얼굴 하나 없는 거대 도시.
지친 고래의 영혼은, 그 거리의 표면을 유령처럼 떠돈다.
어두워지면 알 만한 얼굴들마저도, 금세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다.
수십 년 전부터 여행자는, 거대 도시에서 그런 유령들을 만났다.
최초의 낯섦이나 놀람과 달리,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유령과의 만남은, 이제 지극히 권태로운 일상이 되었다.
여행자는, 아주 흔해빠진 유령의 일원으로서 숱한 유령들을 만난 것이다.
흔히 유령은, 거친 짐승처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상태의 사람을 닮았다.
다만, 그런 유령에게는 미래가 없다. 더구나 과거는 이미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유령으로서의 狀態的 지속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위의 God들은, 인간의 형상을 지닌 유령들의 어두운 코미디를 아주 재미나게 즐기고 있다.
만약 ‘인간 유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들은 천국에서의 무료한 일상을, 결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지전능하다는 신들이 보기에, ‘인간 유령’들의 삶은, 참으로 유치하고 천박할 따름이다. 그런데 그래서 아주 재미가 있다.
아득한 전설처럼, ‘인간 유령’의 소문이 떠돈다. 결국은 떠돌아야만 하는 ‘바람 같은 소문[風聞]’처럼, 현실세계 여기저기에서 ‘인간 유령’이, 다시 떠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행자는, 왜 자꾸 거대 도시를 찾아오는 것일까.
거대 도시에서 여행자는 철저히 고립된다. 저토록 무수한 얼굴 가운데서, 아는 얼굴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극심한 고립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여행자는, 그야말로 철저한 유령이다. 더욱 치열하게 유령으로서 선다. 누구도 지각할 수 없는 흐릿함으로서, 세상에 선다.
과연 이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여행자는 모든 상황이 막막하기만 하다.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한다. 장마와 함께, 현재를 마무리할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대인기피증은 말할 것 없으며, 소음공포증 역시 악화되고만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유령을 관념화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스런 일이다. 관념적 추상은, 곧잘 불가능을 넘어서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불가능을 넘어서는 현상 자체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넘어섬은, 지극히 형이상학적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근대 이후, 지속적으로 형이상학을 해체하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결국 여행자들의 여행은, 지극히 형이상학적이며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행자들의 본성이며, 숙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뇌까렸던 것이다.
“인간이여, 피하라! 가혹한 검은 개가, 너의 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 저 무지한 자들은, 여전히 온갖 욕망의 흔적만을 쫓고 있다.”
욕망의 흔적은 좇는 자들은 유령 자체이며, 그런 유령의 곁을 어슬렁거리는 ‘검은 개’는, 유령의 흔적이다.
사는 동안 ‘니체’는, 시나브로 그러한 실상을 보았던 것이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아주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외려 ‘지금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행복은 좀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작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니.”
여행을 외면하는 많은 ‘인간 유령’은, 실로 불행한 존재다. 그런데 그 불행은, 그가 유령인 탓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외려 지금 그가 지나치게 행복하려고만 애쓰는 탓에, 불행해져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미 심장이 늙어버린 청춘들은, 자기의 그림자에게 화풀이를 한다. 어쨌거나 그들의 심장은, 너무 일찍 취해버렸다.
어느 곳에서든, 유령은 다만 관찰한다. 굳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령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자기가 이미 유령이 되어버린 줄도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유령은 또 다른 유령을 만나서, 새로운 유령을 생산하고서는 아주 기뻐한다. 이제 자기만큼 고통스러워할 새로운 대상적 존재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령들은, 새로운 유령의 생성을 가장 위대한 작업으로 인식한다.
실상, 사는 동안 각 유령들의 유일한 단 한 번의 공동작업이, 섹스를 통한 새로운 유령의 생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유령이 탄생하는 순간, 유령들의 공동의 관계는 동시적으로 마감된다.
고통의 끈질긴 대물림.
이것이야말로 유령들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적절하며 가장 근접한 규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령으로서 살아내는 자여.
그리고 그대, 또 하나의 유령이여.
애써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자 하지 말라.
그대가 누군가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 역시 결코 그대를 이해할 수는 없다.
만약 누군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착각일 따름이다.
본래 유령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이해는, 신의 영역에서나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령들은, 늘 신의 영역을 훔쳐보며 탐내지만, 결국 유령은 신의 영역에 들어설 수 없다. 신의 영역에 근접하려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흔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너는 무엇을 찾아 이곳에 왔느냐?”
‘하얀 노인’의 물음에, 여행자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
그러한 물음에, 누군들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침묵으로 답할 밖에.
먹이를 찢어발기는 하이에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겨운 족속들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런 자들은 그들끼리 잘 어울리며, 도토리 키 재기하듯, 들쭉날쭉 잘도 살아간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유령은 음울하지만 홀가분한 미소를 짓는다.
여행자는 도시에 있다. 아주 거대한 도시에 있다.
거대 도시에 있는 인간의 대부분은 청년이다.
그 까닭은, 청년이 가장 왕성한 노동력을 지닌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
거대한 도시에서, 노동은 곧 자본이다. 노동은, 시간을 내어줌으로써 돈을 얻게 되는 교환적 현상이다. 그리고 돈은, 이내 소모적 상품으로 교환된다.
그런 것이 바로, 유령들의 삶 자체다.
-하략-
도서소개
저자소개
목차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