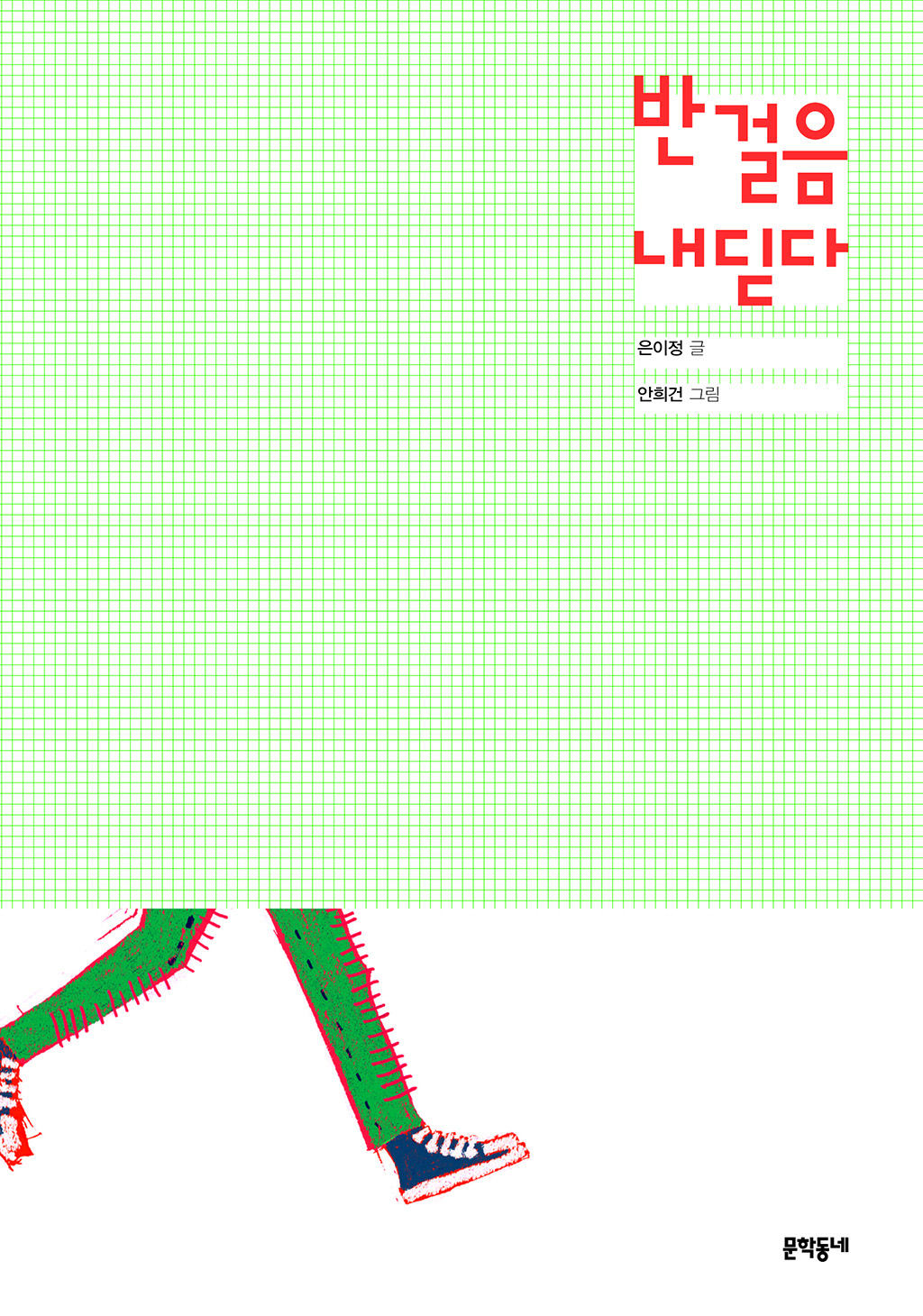1 내 방
2 독고빈
3 또 다른 시작
4 소리 지르기
5 현숙 언니
6 바다
7 착한 사람
8 꿈을 잇다
9 늦은 봄
10 문
11 등산
12 반에 반에 반걸음
작가의 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얼굴이 예쁘거나 말을 잘하거나 성격이 밝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까?"
_주인공 희영의 독백 중에서
독고빈 또는 희영.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아이, 희영은 등굣길에서도 하굣길에서도 늘 혼자 걷는다. 심지어 집에서조차 희영은 혼자다. 제 둘레에 문도 없는 담을 만들고 고치처럼 몸을 만 채 희영은 밖으로 나서길 거부한다. 그것은 희영이 세상을 견뎌내는 방식이다. 내세울 것 없는 자신에게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의 소통 부재에 길들여져 기댈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엄마의 일기장과 한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희영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1. 먼 출발선
희영의 가족은 평범하다. 경제적으로 모자라지도 않고, 폭력도, 격렬한 갈등도, 특별한 소란도 없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가족은 서로 부대끼기보다 각자의 자리를 하나씩 꿰차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다. TV 앞 소파, 컴퓨터 의자, 식탁 누구누구의 자리, 그리고 ‘내 방’. 마치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은신처라도 되는 양 말이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오고가는 대화는 고작 ‘밥’이 다이고, 그나마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는 때라곤 식탁 앞에서 식사할 때뿐이다. 희영은 시시콜콜한 이야기조차 편하게 나눌 수 없는 식구들 때문에 숨이 막히고, 집 안에 발을 들여놓기가 점점 괴로워진다.
학교에서도 희영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다. 또래 친구들보다 도서실 사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만큼 홀로 책 읽는 시간을 즐기고, 그렇게 늘 ‘혼자 있는 자신’을 ‘낭만’을 좋아하는 것뿐이라는 핑계로 포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꼭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희영은 어렴풋이 알고 있다. 실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거절당하는 것이 어색하고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래서 비밀을 공유하고 어깨를 겯고 걸어가는 친구가 그립다가도 누군가 다가오면 움찔 한발 물러서고, 애써 다가가 둘이 되는 것보다 혼자만의 세계에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택한다.
그 런… 희 영 앞 에… 두 가 지… 사 건 이… 일 어 난 다.
하나는 엄마가 중학교 시절 썼던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소년의 등장이다.
#2 출발선 앞
이사하는 날 버려진 책더미 속에 끼어 있던 낡은 일기장을 발견한 희영은, 엄마가 써내려간 기록을 훑으며 엄마에게서 중학생 소녀 시절의 흔적을 좇는다. 미래의 계획과 꿈으로 반짝이던 엄마. 하지만 삼십 년이 흐른 지금, 엄마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제껏 자신이 보아온 엄마가 다가 아니라는 것에 놀라움과 안쓰러움을 느끼는 희영. 왜 엄마는 이러고 사는 것일까? 엄마와 아빠는 왜 자신들 안의 깊숙한 문제에 대해 서로 터놓지 못하고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일까? 왜 혼자서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것일까? 그 물음은 결코 희영 자신에게서도 비껴가지 않는다.
농구대 앞에서 갈깃머리를 휘날리며 허공을 향해 힘차게 튀어오르는 재준을 보는 순간 희영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겁이 나, 희영은 자신이 재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닌 척해도 희영은 재준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희영은 상상 속의 재준과 중학생 소녀인 엄마와 대화를 시작하며 속내를 털어놓는다.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상상 속에서라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편안하니까.
#3 반걸음
하지만 마냥 상상 속에서 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 희영은 조금씩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자기 자신을 되찾으라며 일기장을 내민다. 엄마가 변해간다. 그 변화는 아빠에게 이르고, 희영의 동생인 준영에게 이르고 얼어붙었던 가족은 녹기 시작한다. 상대가 알아서 이해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제 속을 뒤집어보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희영이네 가족. 아빠가 앓고 있는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거듭나는 엄마를 보면서, 희영은 용기를 얻는다. 희영은 재준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면 가까이 가는 것, 설사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환상 속에서 걸어나와 출발선 앞으로 나아간다. 상상 속에서만 숱하게 내밀었던 반걸음, 혼자서 연습했던 대화를, 이제 둘이 하기 위해 희영은 재준 앞에 선다. 진짜 멋진 관계가 숨 쉬는 곳은 혼자만의 낭만 공간인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기회를 준다면 말이야. 너는 네 주변에 담을 세워 놓았잖아.”
걸음을 뗄 준비를 마친 희영에게 건네는 누군가의 이 속삭임은 자신을 내보이기 힘들어하던 희영의 내적 성장과 변화였으며, 희영이 담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떠밀어주는 에너지인 셈이다.
네가 선 바로 그 자리에서 반걸음을 떼어봐, 세상이 달라질 테니까.
그 어떤 커다란 변화도 그 반걸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야.
『반걸음 내딛다』는 소통 부재 앞에 길을 잃어버린 어느 가족,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인 희영의 눈을 통해 인물들의 면면을 비추고, 그들이 어떻게 은신처에서 빠져나와 그들의 문제를 마주하고 그 안에 발을 내딛는지 보여준다. 각자가 내민 ‘반걸음’은 가족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킬 희망을 제시했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주었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고작 반걸음일 뿐이지만 그것이 그 어느 걸음보다 의미 있는 것은, 그 어떤 변화도 처음 내민 그 ‘반걸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일상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가족의 이야기와 재준의 이야기가 희영의 시선 안에서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그 안에 녹아든 안정된 문장,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인다. 언뜻 정적으로 보이지만 섬세하면서 부드럽고 역동적인 희영의 캐릭터는 현실과 조응하여, 꼭 ‘내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