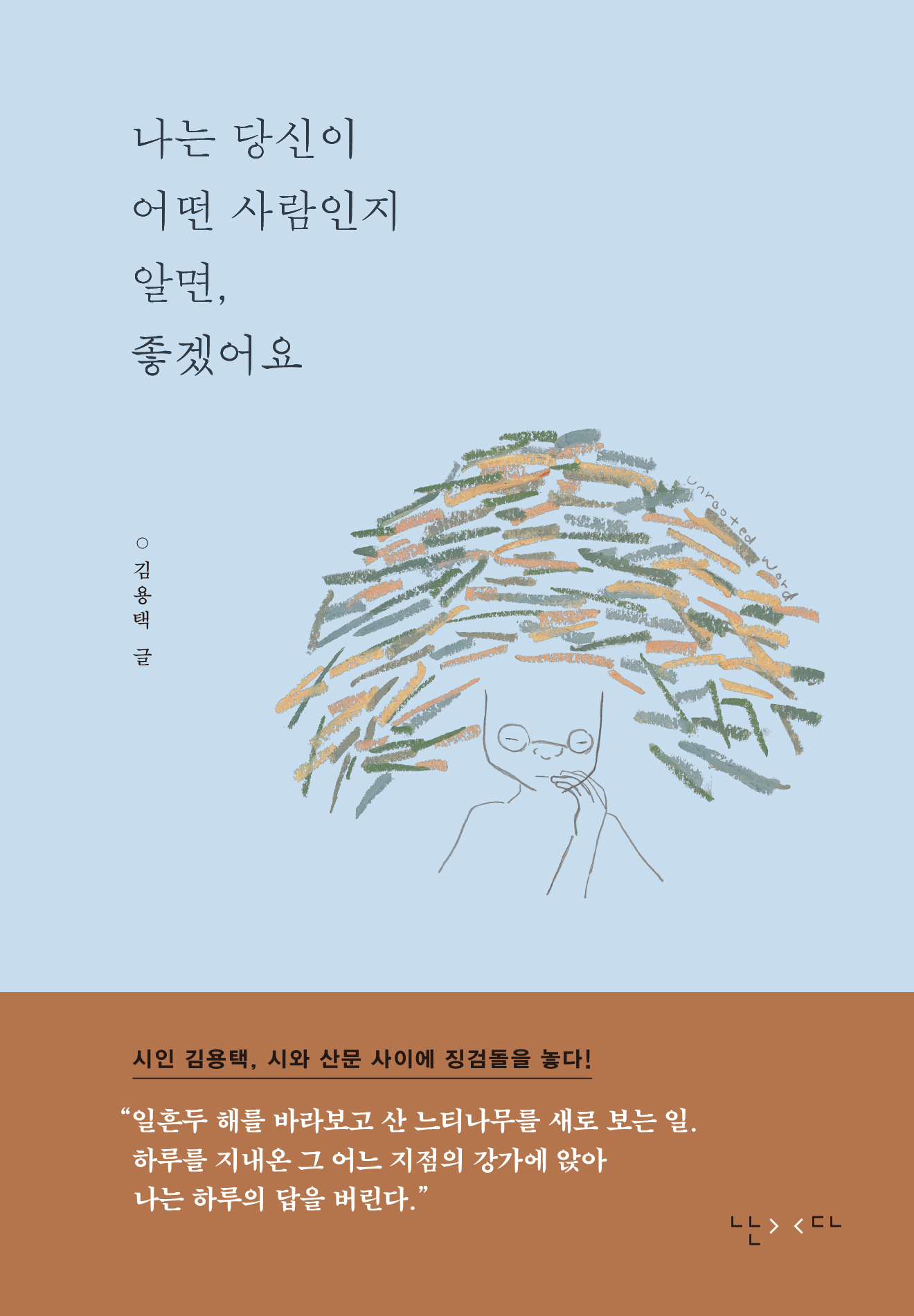들어가며
나무는 정면이 없다
그때는 외로움이 싫었어
도중途中
이 시리게 차다
모든 율동은 다음을 위해 아름답다
새들은 생각과 실현의 간격이 짧다
오늘도 그렇게 하였다
새들의 소란은 수선스러움과는 다른 약속이 있다
내 시를 생각하는데 눈이 왔다
지나고 나서 대개 다 무난하다, 고 한다
새똥이 쌓인 곳
사람들이 버린 시간을 나는 산다
배짱 좋은 산의 색
고요는 손을 씻는 일이다
시인의 산책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좋겠습니다
봄똥 먹은 날
그때 새들은 날아오른다
“나는 오늘 별이 아름답다.”
내 속이 약간 거북하였다
매급시 문상은 와가지고
한강의 시를 읽다
순창 극장
난간을 그려주다
손금으로 봄이 졸졸 흐른다
등뒤에 서 있었다
불안이 따라다닌다
손님이 왔다
흰나비
시
우월이란 세월이 가도 낡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이다
농부의 몸이 봄을 만나면
온몸에 침을 맞다
일의 머리를 찾아간다
개구리가 얌전하게 앉아 있다
나무는 팽나무
영식이가 죽었다
역사는 기다리는 일이다
잘생긴 돌들은 서로 아귀가 안 맞는다
내 발소리는 누가 거두어가는가
아내가 시를 읊다
딱 할말만 쓰였다
땅이 젖어야 한다
생각을 들키는 시들이 있다
이 맘 알지요
알맞았다
구석에 있어도 빛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나는 리오넬 메시가 좋다
이슬비가 새 울음을 물고 내린다
너무 큰 옷은 소매도 찾기 어렵다
무리란 돌보지 않는 것이다
소용없는 말
시계 뒤에서 바람 속으로
생각대로 안 된다
정신이 초토화되었다
딸이랑 이야기하면 차분해진다
4월은 잔인한 달
저 나무까지다
통증
절해
검은 바다
나가사키
전화
딸 편지 세 통 ● 첫번째 편지?아빠
딸 편지 세 통 ● 두번째 편지?아빠
딸 편지 세 통 ● 세번째 편지?아빠
봄날
나무 위로 나비가 날아가요
맛난 글
현선이네 집
봄맞이 꽃 시를 쓰다
칠십이 년
거기서부터
어둠을 품은 느티나무
옛날 시를 찾았다
어둠도 부드러운 봄날
날이면 날마다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다
이슬
모든 것을 이긴 색
새벽 한시 반쯤 시를 쓰다
김영랑이네!
팩
해 질 무렵
해당화
결혼기념일
눈가가 젖어 있다
자자 하고, 잤다
아기 상추 비빔밥
새들의 소란
최소주의자의 이 하루
서 있는 풀대
나비
빈 나뭇가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집
당신의 당신이 하루종일 한 일
이러다가 우리 싸우고 말지
이런 거 가지고
집
나의 산
나의 강에서
5·18
당신이 가만가만
보슬보슬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달이 내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날 아침
오래오래
해 뜨기 전
새들도 말을 안 듣는다
바람이 일었던 곳
아무도 묻지 않았다
봄이 감나무 그늘을 나갔다
달은, 그래서 늦게 온 것이다
나가며
시처럼 피어서 꽃이 되고
산문처럼 펼쳐져 돗자리가 되는 글
김용택 시인의 글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좋겠어요』를 펴낸다. 이 책이라 하면 일단은 징검돌과 같다 하겠다.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야 할 여러 순간마다 안전하게 안도하여 발을 밟게 하는 단단하면서도 평평한 그 돌과 같다 하겠다. 이 책에 실린 글은 그 징검돌로 오갈 수 있는 시와 산문 사이라 하겠다. 어느 순간은 시처럼 피어서 꽃이 되는 글이라 하겠고, 또 어느 순간은 산문처럼 펼쳐져 돗자리가 되는 글이라 하겠다. 이 책에 실린 글은 그 징검돌로 오갈 수 있는 일기와 편지 사이라 하겠다. 어느 순간은 일기처럼 꼿꼿하니 나무가 되는 글이라 하겠고, 또 어느 순간은 편지처럼 다정해서 아내와 딸이 되는 글이라 하겠다. 이 책에 실린 글은 그 징검돌로 오갈 수 있는 전화와 문자 사이라 하겠다. 어느 순간은 전화처럼 솔직하니 사랑도 고백하게 하는 글이라 하겠고, 또 어느 순간은 문자처럼 은밀하니 사랑도 삼키게 하는 글이라 하겠다.
세상에 이런 글이 다 있다니! 그런데 정말 이런 글이 여기 다 있다. 그리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저에는 평생 “나는 끝까지 어리다”라 말해온 김용택 시인의 변치 않은 동심이 시심으로 뚝심 있게 매 페이지를 채우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다. 그래 그 눈. 그러니까 김용택 시인만의 그 눈.
그는 매순간 보는 사람이다. 그는 제 생각 이전에 제 봄을 우선에 두는 사람이다. 보는 그대로 말하고 말한 그대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생각한 대로 말하려 할 때 끼는 불순물 그대로를 끝내 분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곧이곧대로, 그 말을 몸으로 보여주는 예는 일견 자연뿐이라 할 때 김용택 시인은 그 자연 속으로 빠르게 스밀 줄 아는 사람이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을 보고 자연을 듣고 자연과 말하고 자연과 다투고 자연과 화해하고 자연을 쓰다듬고 자연에게 멀어졌다 다시금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들어가 자연 앞에서 침묵하는 일로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깊은 과정을 스리슬쩍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내용에 어려움이 없고 문장에 막힘이 없으며 사유에 복잡함이 없고 말씀에 가르침이 없는 이 책은 시인 김용택의 집에, 시인 김용택이 산책하는 길에, 시인 김용택이 만나는 사람들에, 시인 김용택이 만나는 자연에 CCTV라도 설치해둔 듯 일단은 너무도 솔직하고 놀랄 만큼 생생한데 그의 그런 일상을 엿보며 문득 나의 일상을 반추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앞서 말한 어떤 사이라 할 때의 징검돌을 다시금 재확인하게도 되는 것이다. 그를 보느라 글의 징검돌을 건넜는데 내가 보이는 일. 그렇게 나로 하여금 나를 만나게 하는 글의 주인이 시인 김용택일 터.
나이 칠십을 넘어서도 시인 김용택은 늘 새롭다 한다. 그가 새롭다 할 수 있는 데는 그 새로움을 발견하러 다니는 그의 부지런함에 기인한 바 클 것이다. 그 발견의 구덩이마다 그는 불쑥 뛰어든다. 거기서 혼자 놀다 나올 때면 해는 떴다 져 있고 계절은 왔다 가 있고 배는 불렀다가 꺼지고 아내는 어느 틈엔가 나이가 들어 있고 딸은 어느 틈엔가 자라 있어 그는 토끼같이 둥근 눈을 더 크게 뜬 채 두리번거린다. 그 눈 가득 호기심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다.
글에도 자주 등장하는 시인 김용택의 딸 김민해가 그림을 그렸다. 글과 그림이 묘하게 닮아 있는 데는 서로가 서로의 결을 빼닮아서일 거다. 욕심이 없고 잘 버리고 그러나 곧고 그리하여 심플하다. 나무라 비유해볼까나. 만만한 게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내 아는 게 나무라 여겼는데, 만만치 않은 게 나무임을, 세상 어떤 나무도 간단치가 않음을 알게 한 이 책의 힘은 한 구덩이 속 제자리에서 평생을 사는 나무의 그대로 거기 있음, 가면 늘 거기 있음의 묵묵함에서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게나, 이 쉬운 게 그렇게나 어렵다는 얘기일 거다. 나무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나무를 보게는 하는 책, 시인 김용택을 좇아보니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