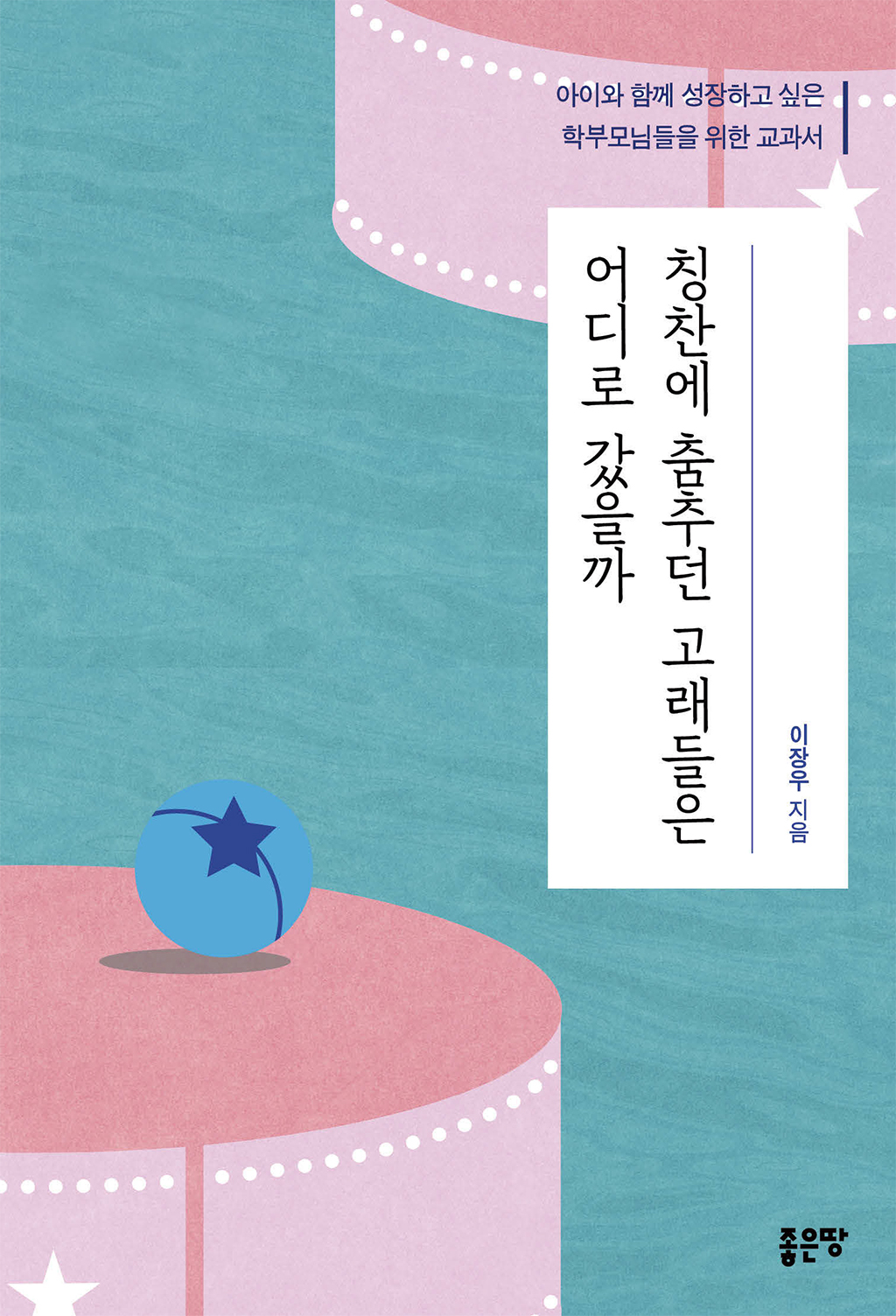나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사는 것이 꿈이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북적거리는 사람들이 좋았고 구체적인 꿈은 없었지만, 항상 서울을 동경해 왔다. 운이 좋게도 수능을 잘 봐서 서울에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전공을 고민하던 중 어릴 때의 일상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셨는데, 옆에서 조수 노릇을 자주 했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이 좋았고 돈을 벌고 돈을 세는 것이 재미있었다.
이런 계기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꿈만 같던 서울에서 잊지 못 할 20대를 치열하지만 즐겁게 보냈다. 졸업 후 대기업(LG)에 취직을 하면서 구미로 내려오게 되었고 20대의 마무리와 30대의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정착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단순 반복의 일과와 회사 내 사람들과의 복잡 미묘한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은 생은 이렇게 ‘별 탈 없이 마무리하며 자연사하겠구나’ 하는 허탈함 때문이었을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을 해내야 한다는 무게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월요일 아침이 가장 즐거운 인생을 살자’는 나 자신과의 좌우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생각과는 다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을 조금 넘긴 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하던 중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수능을 다시 시작하여 28살의 나이에 춘천교대에 입학하게 된다. 남들은 한 번도 못 해본 두 번째 캠퍼스 생활을 부모님 등골을 두 번이나 빼먹으며 만끽하고 포항으로 첫 발령을 받게 된다. 회사의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실의 아이들은 살아 있는, 그야말로 1분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체험 삶의 현장이었다. 마치 어릴 때 내가 느낀 시장의 느낌이었다. 그때 이 길이라면 썩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시끌벅적 즐거워 보이는 시장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사연이 있고 그 속에는 치열한 삶이 있음을 알고 아이들이 힘들어질 무렵, 코로나가 닥쳤다. 갑자기 교실에 아이들이 사라졌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사라져 한숨 돌리고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기쁠 줄만 알았지만 허전하고 허무했다. 원래 소중한 것은 없어진 다음에야 안다고 하지 않는가. 다시 아이들이 그립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었다. 스트레스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아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생각이 나를 궁금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해결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었다. 텅 빈 교실에서 아이들과 지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이 책을 썼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행복하게 교직생활을 하고 싶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생각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며 글을 써 봤다.
이 책은 학교에서 교사의 시각에서 본 아이의 행동과 마음을 서술하였다. 가정에서 본 부모의 시각이 아닌 교실에서 교사의 시각을 보여줌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학부모님들에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었고, 아이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지금도 아이들은 나에게 행복한 스트레스다. 행복한 스트레스와 부대끼며 아이를 같이 키우는 협력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