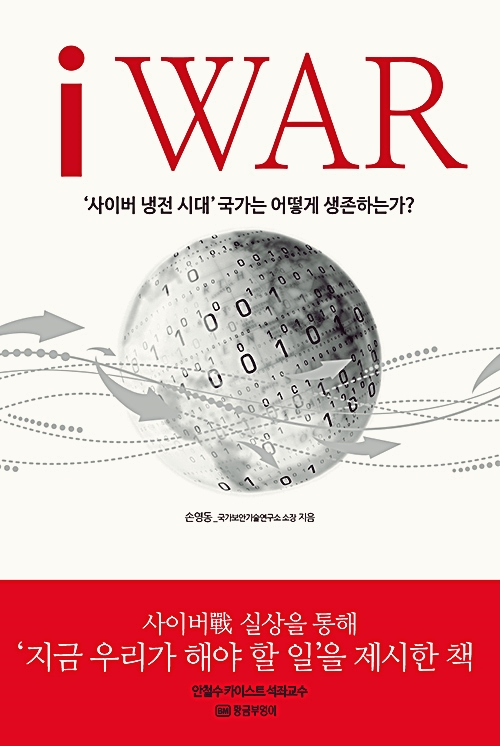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내ㆍ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및 중국발 해킹으로 절취당한 국가 주요자료는 13만 건에 달한다. 2009년 들어 군에서는 하루 평균 9만 5,000여건의 사이버 공격이 탐지됐고, 이는 2008년보다 20%나 증가한 수치다. 2009년 11월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7’ 자료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0년 5월에는 10대로 구성된 한 유명 사이트 회원들이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침입해 사이버 테러를 가했고, 8월 15일에는 국내 선두 게임업체인 피망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공공기관과 포털, 금융기관 등에 큰 피해를 입혔던 디도스 공격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디도스 대란을 계기로 많은 업체들이 보안 장비와 솔루션을 마련했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 테러를 막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책은 이러한 공격이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이 될 것이다. 사이버 전쟁이 쓰나미 보다 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이 도를 넘어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각국이 인식해야 한다.’ 는 유엔의 보고처럼 사이버 전쟁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을 대비해 미국은 2009년 6월부터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2010년 5월 사령관을 임명했다. 중국은 250여 개의 사이버 부대에 걸쳐 5만 여명의 사이버 전사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컴퓨터센터에만 800명의 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아피社에 따르면 사이버 무장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고 미국ㆍ이스라엘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5개국은 이미 사이버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반이 약한 상태이다. 최상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최적의 공격 요건이 되어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책에는 이런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겼다. 책은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이버 전쟁이란 주제를 다양한 사례와 역사, 각 국의 상황들로 광범위하게 되짚어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정보통신 기자로 시작해 국내 최초의 PC통신인 KETEL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KTH에서 HiTELㆍParan 인터넷서비스를 개발하다가 2008년부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저자의 이력이 말해주듯 현장 전문가만이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때문에 보안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