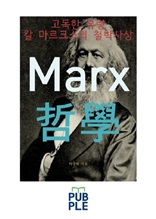논어에 반하다
도서정보 : 김석 | 2019-01-21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논어》는 왜 그토록 수없이 되새겨 읽히는 공감의 생명력을 가졌을까?
공자는 성인(聖人)일까, 속인일까, 진보주의자일까, 보수주의자일까?
2,500여 년 전 공자가 있었다. 공자는 혼돈의 춘추·전국시대에 천하를 주유하며 정치개혁과 사람됨을 가르치고 실현해보려 했던 관료이자 교육가, 사상가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다가 70이 다 되어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와 후진 양성으로 여생을 마쳤다. 공자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스승의 깊고 높은 가르침을 받아 적거나 기억하고 되새기려 했다. 그들은 자신이 보거나 전해들은 스승의 말과 행적을 “선택”하여 아주 간략하게만 죽간이나 목간에 기록해 《논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논어》는 처음에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발화된 “말”이었지만 기록의 과정에서 정황과 대상, 주체가 생략되거나 관점과 강조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입과 생각을 거쳐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지면서 마침내 “경전”이 되었다. 이렇듯 《논어》는 하루아침에 쓰인 것도, 특정의 누군가 작정하고 쓴 것이 아니기에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주석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구절마다 편마다 다른 해석과 입장이 있고, 그 해석에 대한 주석과 주석에 대한 주석이 꼬리를 잇기에 종종 현대의 독자들은 길을 잃고 머뭇거리게 된다. 도대체 《논어》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읽는 것이 정확한 ‘논어독법’이 되는 걸까?
오늘날에도 유효한 《논어》의 힘, ‘나의 나됨’과 ‘사회’를 생각하게 하는 고전,
풍요로운 지혜와 사색의 보고(寶庫) 《논어》에 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책은 한 법조인으로서 인간과 법, 정치가 엮어내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해석과 판단의 갈림길에서 씨름하는 고민과 성찰 속에서 얻은 《논어》 읽기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논어》와 공자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한 축으로 풀어가며 잔잔한 집중과 심도 깊은 탐구의 재미를 제공한다. 공자가 마구간에 난 불을 보고 말과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달항당 사람의 비아냥거림을 해석하는 것 등 《논어》의 여러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공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해 ‘만들어져가는 공자’, ‘신격화되어가는 공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동안 흥미롭게 《논어》에 빠져들게 한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논어》의 주요 어휘인 인, 의, 예, 지, 덕, 도, 충, 효와 수기안인, 군자, 배움 등 여러 개념들을 따져 봄으로써 공자의 크고 넓은 철학적 뒷받침을 음미할 수 있게 한다. 독자들은 비록 주왕을 그리며 무너져 가는 봉건제와 혼란한 춘추 전국시대를 이상주의적으로 되살려보려 안간힘을 쓰는 한계를 보이는 공자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를 개혁하고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위해 노력해가는 공자의 인본주의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정치사상을 엿볼 수도 있다.
공자를 알게 되면 《논어》를 이해하게 되고, 《논어》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공자의 철학에 닿는 지름길이자 동양사상의 한 핵심을 꿰뚫는 길이기도 하다. 이 책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열려 있는 공자의 철학, 끊임없이 나와 우리를 되새겨 보게 하는 사람됨의 거울이자 지성의 원천인 《논어》를 맛깔스럽게 다시 상찬해 놓았다는 공을 받기에 충분하다.
구매가격 : 10,000 원
양명 철학, 조선왕조 이단 사문난적 양명학 윤휴 박세당 정약용
도서정보 : 탁양현 | 2019-01-18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제1장. 王守仁의 陽明學
1. 主觀的 觀念論者 王陽明
王守仁(1472~1528)은, 중국 明나라의 정치인이고 교육자이며 사상가이다. 陽明學의 창시자이며, 心學의 集大成者로 꼽힌다. 號는 陽明, 字는 伯安이다. 明代(1368~1661) 中期의 대표적 철학자로서, 정치가이며, 주관적 관념론자이다.
明나라 초기에는 朱子學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에 대해 그는 독자적인 儒學思想을 내세우고, 특히 陸象山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그의 사상은 知行合一, 靜座法, 致良知 등을 원리로 하는데, 이것들은 또한 그의 사상 발전의 단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의 사상을 통해 일관하고 있는 것은, 物의 理, 즉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마음 이외의 곳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말에서 보이는 바처럼, 心卽理라는 주관적 관념론의 입장이다.
2. 王陽明과 陸象山
陽明學을 불러일으킨 陸九淵(1139~1192)은, 중국 南宋의 사상가이다. 字는 子靜, 號는 象山, 諡號는 文安이다. 撫州 金谿縣(江西省) 사람으로, 兄인 九韶와 함께 학문으로써 이름을 남겼다. 1172년(乾道 8년) 진사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관으로 종사하면서 자제교육에 종사했다.
陸象山 사상의 특색은 心卽理이다. 그에게 있어서의 理는, ‘천지가 천지여야 할 것’으로서, 그 입론의 기초는 宋代의 다른 사상가와 다른 바가 없다. 그런데 理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北宋 이래 개개의 사상가에 따라서, 논리의 입증이 달랐다.
그것은 주로 그와 같은 존재의 窮極者(존재를 존재로 하는 것)와 ‘나’인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향을 달리했던 것이다. 陸象山은 이에 대해서, 마음(心)은 一心이며, 理는 一理이다. 이 心은 이 理여서, 둘로 나뉘어 있는 一은 없다고 말하고, 우주 안의 一은 자신의 分內의 一이며, 자신의 분내의 一은 우주 안의 一이라고 했다.
다시 사람의 心은 지극히 靈(뛰어나다)하고, 이는 지극히 분명하다. 사람은 모두 이 心을 가졌고, 心은 모두 이 理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는 朱子가 格物致知論에서 주장한, 一物에 一理가 있고, 事事物物의 理를 밝힘으로써 만물의 일리를 얻는다는 논리와는 다르다.
3. 陸象山의 心卽理
陸象山의 理는 사물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존재의 理는, 그것을 그것이라고 조정하는 바, 나의 마음 속에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나의 마음이 理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것, 즉 理는 내 마음의 理라고 하여, 心卽理를 설파한 것이다. 따라서 이 一心이 만물의 理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는 여하한 물건도 부가할 필요가 없고, 마음을 가리고 있는 惡弊만을 제거하면 된다.
그래서 독서 강학이라든지 사색 등도 도리어 유해하다고 한다. 그의 유명한 “六經은 나의 註脚에 불과하다”는 말은,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太極圖說을 둘러싼 朱子와의 논쟁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朱子가 陰陽二氣와 道를 形而上下로 나누고, 無極이면서 太極인 것을 道, 즉 理라고 한 데 대하여, 象山은 無極은 老子의 말이니, 易의 太極이라는 말로 족하다고 하였다.
즉, 易에서 “一陰 一陽, 이를 道라고 한다”고 하였듯이, 그는 도설의 위작론을 더하여, 더욱 격렬한 논쟁으로 朱子에 대항하였다. 象山의 사상은 명대의 陳白沙를 거쳐 王陽明에게 영향을 끼쳤다.
-하략-
구매가격 : 3,000 원
고사성어를 알면 중국사가 보인다
도서정보 : 이나미 리쓰코 | 2019-01-15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중국 사천 년 역사를 장식한 수많은 명장면들. 그 속에서 명군, 폭군, 영웅, 시인, 때로는 미인이 어우러져 함축적 의미를 지닌 다양한 말들이 탄생했다. 중국 고사성어는 매우 정제된 표현으로 당대의 역사적 주요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주며, 시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삶의 교훈을 일깨워주었다. 이 책은 다양한 고사성어를 소개하면서 그 탄생 배경인 중국사의 흐름을 더듬어본다. 중국사의 명장면 속에서 피어난 고사성어들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이다.
구매가격 : 8,800 원
진보주의 정치철학, 수운 최제우, 안토니오 그람시
도서정보 : 탁양현 | 2019-01-1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保守主義와 進步主義 그리고 大韓民國憲法
‘수운 최제우(1824~1864)’와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는, 서로 30여년의 時空間的 差異를 갖는다.
최제우가 퇴장하고서, 한 세대쯤 지난 후 그람시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天地自然의 거대한 역사적 수레바퀴를 감안하다면, 거의 同時代를 체험했다고 해도 크게 그릇될 것은 없다.
進步는 退步와 대척되는 개념으로서,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그러니 天地自然 안에서 ‘온 존재와 온갖 것’들은 죄다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제우와 그람시를 통해 제시되는 進步主義라는 개념 역시, 지극히 相對的임을 유념해야 한다. 保守主義의 관점에서 對蹠的으로 분별할 때 진보주의인 것이지, 그러한 向心 자체는 지극히 본래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 역사에서 ‘高句麗의 南下’라는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그 의미규정은 달라진다.
新羅나 百濟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들의 세력권을 침략하는 행위로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륙에서 세력을 다진 후, 해양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는 행위로 인식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南韓人들은, 대체로 前者의 관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朝鮮王朝를 거치면서 형성된, 韓半島만이 우리의 영토라는 半島史觀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관점에서 역사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신라나 백제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역시 분명한 우리 韓民族 先祖들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적 변화야말로, 진보주의적 사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존재가 살아내는 동안, 얼마만큼의 富貴榮華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 탓에, 누구라도 막연한 羨望을 지닌다. 그러다보면 지극히 유치하고 사소한 일에도, 死生決斷 하듯이 임하게도 된다. 그런 것이 인생이니까.
지난 시절에 필자 역시, 그러한 상황들을 여실히 체험했다. 특별한 利害가 연관되지 않는데도, 그저 자기보다 많은 것을 누린다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 집단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던, 잔뜩 腐敗되어버린 눈빛들, 그런 눈빛들이 당최 잊히질 않는다.
‘니체’의 선언처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일 따름임을 절감한다. 이러한 체험으로써, 필자에게 進步主義的 태도란, 天地自然 안에서 스스로/저절로 그러하게 淡然히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필자는 作家가 되었다.
필자로서는 當時가 回想되면, 무슨 까닭인지, 朝鮮王朝의 朋黨이라는 舊態的 ‘떼거리’ 정치와, 그에 얽힌 異端으로서 斯文亂賊이라 규정되어 排斥당한 尹?, 朴世堂, 丁若鏞 등이 연상된다.
또한 民主主義의 盲點인 多數決 獨裁에 의한 人民裁判 식의 作態도 그러하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활용되는가에 따라, 그것은 전혀 非民主的인 상황을 연출케 된다. 그러니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런 자들의 殘像으로서 기억되는 것은, ‘大衆 集團無意識’의 淺薄함과 殘酷함일 따름이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서, 集團共同體의 生來的인 정치적 태도는 保守主義인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를 지니는 것은, 어쩌면 人之常情이다.
제아무리 進步主義를 표방하더라도, 그러한 진보주의가 執權한 후에는, 이내 보수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것을 簒奪하는 순간까지의 진보주의는 가능하지만, 집권한 이후의 진보주의는 不可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李成桂와 鄭道傳의 革命勢力은, 보수세력인 高麗王朝에 대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세력이었다. 그래서 易姓革命을 실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권하는 순간, 지극히 보수주의적인 정치적 태도를 드러낸다. 국제지향적이며 黃帝國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던 高麗王朝에 비한다면, 더없이 보수주의적인 態勢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금세 새로운 세력집단에 의해 政權을 찬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當代의 문제이며, 역사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評價가 내려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의 대한민국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保守主義는 미국과 일본을 爲始한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이념으로 삼는다. 進步主義는 중국과 북한을 爲始한 ‘무언가’를 이념으로 삼는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不法하다는 비난에 처할 수 있으므로, 다소 침묵한다.
실상 남한의 진보주의가 추종하는 것은, 人民民主主義와 主體思想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보수주의의 입장에서는 결코 납득될 수 없는 대목이다.
비록 동일한 이념을 추종한다지만, 일본에 대한 역사적 悔恨을 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남한의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를 추종한다는 것은 당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단순히 정리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단지 정치적 요인만으로 연출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여기에는, 저 먼 古代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요인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역사적 요인은, 당최 明晳判明히 드러난 부문이 不在하다.
上古史는 五里霧中이며, 高麗史는 外勢가 왜곡하기 전에 조선왕조가 스스로 이미 철저히 왜곡해버렸고, 朝鮮史는 日帝에 의해 왜곡되어버렸다. 그리고 東北工程과 植民史觀에 의한 왜곡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역사적 요인은 이내 문화적 요인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민족끼리’라는 슬로건에 대해 異見이 紛紛한 것이다. 과연 民族이란 무엇이며, 누가 민족이며, 어떻게 민족인지의 여부가, 현재에 이르도록 마땅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이, 卓上空論 식의 말싸움쯤으로 마감될 수 있다면 크게 우려할 바 없겠으나, 이러한 대립은 경제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경제라는 것은, 인간존재의 ‘生存의 利得’을 결정하는 분야이다. 이를 상실케 되면, 생명의 미래적 보장은 없다. 그래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옷이나 집을 양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것은 나눠가질 수도 있다. 경제발전이 되면서 여벌의 잉여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밥의 문제는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 밥이란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의 이득’이다. ‘三時 세끼’의 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生命(欲望)의 보장은 없다. 그러니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양 측의 대립이 이러한 ‘밥의 영역(욕망의 영역)’을 건드리게 되면, 이내 ‘혁명적 충돌(戰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불과 몇 해 전에 체험한 바 있다. 그래서 아무리 순한 개라도, 제 밥그릇을 건드리면 문다고 하지 않던가.
政治란, 공동체 구성원의 밥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人民의 밥(욕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政權은, 결국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에 있어, 그 準據가 되어줄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大韓民國憲法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이든, 대한민국헌법에 判斷尺度를 두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法律이라는 것은 言語로써 정립된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문제가 된다.
언어라는 것이 분명히 공통하는 의미를 지정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어떠한 논쟁일지라도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헌법에 그 준거를 둠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이익(國益)’을 목적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공동체는 인간존재의 생존에 있어 가장 바탕이 되는 토대이다.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憲法 前文
悠久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운동으로 건립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營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上記한 헌법 전문에는 유념할 대목이 여럿 있다. 우선 大韓國民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말 그대로 大韓民國의 國民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각 개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국민으로서, 生成的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국민이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가장 우선되는 존재임은 말할 나위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토대로서, 3·1운동, 大韓民國臨時政府, 4·19민주혁명 등을 摘示한다. 그 이전의 역사는, 悠久한 역사와 전통이라는 표현으로써 가름하고 있다.
유구하다는 것은 멀고 오래되었다는 의미다. 그 멀고 오래됨은, 東夷文明(遼河文明)으로부터 始原하여, 古朝鮮, 夫餘, 高句麗, 統一新羅, 渤海, 高麗, 朝鮮王朝로 이어지는 역사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使命은,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이다. 南韓의 경우 민주개혁으로써 세계적인 民主化를 이루었으나, 北韓의 상황은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非民主的 상황에 있다.
이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명과도 연관된다. 북한의 비민주적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평화적 통일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使命을 작동시킴에 있어, 이념적 토대가 되는 것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이다. 이는 곧 自由民主主義를 추종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헌법이 모범으로 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온갖 형태의 民主主義가 있는 탓이다.
예컨대, 북한의 人民民主主義도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균등, 능력발휘, 세계평화, 인류공영, 안전, 자유, 행복 등의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거대한 이상주의적 개념들을 열거하는 까닭은, 각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개념들은 지극한 理想들이다. 人類史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동시적으로 충족되는 이상사회는 실현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이상사회의 도래를 예견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헌법에 적시된 理想主義를 현실세계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現實主義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헌법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를 실제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러한 目的的 志向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본래 理想鄕이란 실현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상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하략-
구매가격 : 3,000 원
허균 인문학, 조선왕조 진보주의 작가 허균 성소부부고
도서정보 : 탁양현 엮음 | 2019-01-1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1. 학문에 관하여: 學論
학론(學論)
옛날의 학문하는 사람이란, 홀로 제 몸만을 착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체로 이치를 궁구해서 천하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道)를 밝혀서 뒤에 올 학문을 열어주어, 천하 후세로 하여금, 우리 학문은 높일 만하고, 도맥(道脈)이 자기를 힘입어 끊어지지 않았음을 환하게 알리려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유자(儒者)의 선무(先務)로 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씨는 역시 공변되지 않은가?
그런데 근세(近世)의 학자라고 말해지는 사람이란, 우리 학문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며, 또한 홀로 제 몸만을 착하게 하려고도 않는다.
입으로 조잘대고, 귀로 들은 것만을 주워 모아, 겉으로 언동(言動)을 꾸미는 데에 지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도(道)를 밝히오. 나는 이치를 궁구하오.”
이러면서, 한 시대의 보고 들음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고찰해 보면, 높은 명망을 턱없이 거머쥐려던 것뿐이었고, 그들이 본성(本性)을 높이고, 도(道)를 전하는 실상에 있어서는, 덩둘하여 엿본 것도 없는 듯하니, 그들의 마음씨는 사심(私心)이었다.
그렇다면 공(公)과 사(私)의 분별이요, 참과 거짓의 판별이다.
어찌하여 수십 년 이래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某)는 학자이고, 모(某)는 진유(眞儒)다.” 하면서, 망령되게 서로 추켜주고 자랑하기에 바빠하는가? 그런 일 또한 미혹된 짓이다.
일찍이 보건대, 소위 진유(眞儒)란, 세상에 쓰이게 되면, 요(堯)ㆍ순(舜) 시대의 다스림과 우(禹)ㆍ탕(湯)ㆍ문(文)ㆍ무(武)의 공적이 사업에 나타난 것들이 이와 같았고, 쓰이지 못하더라도 공(孔)ㆍ맹(孟)의 가르침과 염(濂)ㆍ낙(洛)ㆍ관(關)ㆍ민(?)의 학설을 책에 기록한 것들이, 또 이와 같아서, 비록 천만년이 지나도 이의(異議)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씨가 공변되어서다.
오늘날의 거짓 선비는, 실속 없고 근거 없는 말을 하여, 입을 열면 이윤(伊尹)ㆍ부열(傅說)ㆍ주공(周公)ㆍ공자(孔子)의 사업을 자신이 담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가 쓰여지면 손과 발을 놀리지도 못하고 실패하여, 자신을 수습할 수도 없게 되어, 당세의 비웃음과 후세의 의논이 있기 마련이다.
약간 더 교활한 자들은,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요량하고, 명망이 훼손됨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문득 나서지도 않고, 그의 졸렬함을 감춰버린다. 이런 것 역시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씨가 사심(私心)이어서다.
슬프다!
거짓이 참을 어지럽게 하여, 온통 이러한 극단에 이르게 하고는, 마침내 임금으로 하여금, 도학(道學)을 싫어하여 쓸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여기도록 하였다.
이는 거짓과 사심을 지닌 자들의 죄이지, 어찌 진유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으랴.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도학(道學)한다는 선비들이 더러는 화란에 걸리고, 더러는 끝까지 그의 시정책을 펴지 못하기도 하였다.
모르기는 하지만, 당세 임금으로 있던 분들이, 과연 그들의 도(道)를 써서 시행했더라면, 공렬(功烈)을 옛사람에게 비길 수 있었고, 이 세상을 요ㆍ순의 시대와 같게 할 수 있었겠는가?
국론(國論)이 두 갈래로 나뉨으로부터, 사사로움에 치우친 의논들이 무척 치열해져, 더러는 저들만이어야 한다고 이들을 헐뜯고, 더러는 갑(甲)만을 높이고, 을(乙)은 배척하여 소란하게 결렬되어서, 그 옳고 그름이 정해지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모두 사심으로 듣고 보아서 그렇게 되지 않음이 없으니, 어느 누구를 탓하랴!
얼마 전에 이른바 오현(五賢)을 문묘(文廟)에 배향하였다.
당시 의논하던 사람들은, “다섯 분 이외에 배향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우 가소로운 일이다.
어진이들이 어떻게 정해진 인원이 있다고, 반드시 다섯 분으로만 한정하랴.
만약 그렇다면, 이후에는 공자나 안자(顔子) 같은 학자가 있더라도, 배향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공자ㆍ안자 같은 분들의 탄생은 예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야은(野隱) 길재(吉再) 같은 충성심으로 우탁(禹倬)ㆍ정몽주(鄭夢周)의 학통을 직접 전해 받았고, 서화담(徐花潭)의 초월한 경지를 혼자 터득함과, 이율곡(李栗谷)의 밝은 식견과 큰 아량까지를, 어떻게 후중함이 적으니 취할 게 없다고 하여,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인가?
더러는 헐뜯는 사람도 있으니, 이점 또한 사심과 거짓의 해악이다.
만약 한훤(寒暄 金宏弼)과 일두(一? 鄭汝昌)가, 불행히도 1백 년 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그러한 헐뜯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하랴.
또 율곡(栗谷)으로 하여금, 다행히도 1백 년의 앞에만 태어나게 했다면, 그분이 존숭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건 마음씨의 공변되지 못함에서 연유되는 것이요, 관찰하기는 싫어하고, 남의 말 듣기만을 숭상하는 일반적인 세태에서 나오는 짓이다.
임금이 진실로 공(公)과 사(私)의 분별을 밝게 한다면, 참과 거짓도 알아내기 어렵지 않으리라.
이미 공과 사,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 반드시 이치를 궁구하고 도리를 밝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들이 배운 것을 행하리라.
그들의 겉이나 꾸미는 자들은, 감히 그들의 계책을 행하지 못하여, 모두 깨끗이 거짓을 버릴 것이며, 나라의 커다란 시비(是非)도, 역시 따라서 정해지리라.
그렇다면 그러한 기틀[機]이 어디에 있을까?
임금의 한 몸에 있으며, 역시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따름이다.
-하략-
구매가격 : 3,000 원
주자 철학, 조선왕조 통치이데올로기 주희 주자학
도서정보 : 탁양현 | 2019-01-1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제1장. 朱子哲學 一般
동아시아 사회에서, 朱熹의 사회정치적 구상의 영향력은 심대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예상외로 정확히 朱子의 사회정치적 구상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의 사회정치적 구상이 그토록 宋代 士大夫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동아시아사회에서 영향력이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위의 질문들에 대해 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주자의 사회정치적 구상이라는 주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서, 기존의 주자의 사회와 정치에 대한 학설과 의견들을 재검토함은 물론, 儒敎와 중국사회의 통합성의 관계에 대하여 기존과는 매우 다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주자가 궁극적으로 창조하려고 하였던 것은, 인간의 本性에 바탕한 도덕적 자율성에 기초하여, 사회가 자기조직화 할 수 있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주자는 자신의 學을, 단 하나의 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心의 수양과정과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學을 통하여, 인간사회는 개인의 心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정치적 질서의 구현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자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은 동일한 理를 공유하며, 결국 理는 하나이기에, 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올바른 패턴이 개인과 사회 양방에 모두 자연스럽게 구현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公을 지향한다는 근본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외부에서의 강제와 개입 없이 자기조직화될 때, 사회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것이 유일하게 옳은 사회질서라고 한 주자의 주장은, 현실세계와 크게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주자가 어떻게 이러한 현실과 자신의 주장과의 괴리를 극복하여, 자신의 사회정치적 구상에 기초한 질서를 南宋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어젠더로 제시하려 노력하였는가에 두었다.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희생시키지 않지만, 그렇다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心의 작용에 의해, 인간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도 방관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주자는 끝임 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해답을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어젠더로서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주희의 정치사회적 구상으로서의 學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과 시각,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를 다루고 있으며,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고안한 기제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서를 구상하고 있었나를 설명하고자 한다.
주희는 분명히 富國强兵을 추구하는 사회정치적 질서에 반대를 표하였으나, 단순한 도덕적 이상주의와 구별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자가 제시한 자기조직적인 사회정치적 메커니즘으로서의 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구성되는 사대부사회를 이해한다면, 송대 이후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지방 엘리트들의 자기 조직적인 다양한 활동에서 나타나는 분산적인 힘과,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정한 통합적인 패턴을 보이는 중국사회의 통합성의 성격에서 보이는 二重性을 이해함으로써, 주자의 學이 동아시아 사회에 제공한 통합성의 성격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 자체에 통합성에 대한 수사적 연속성을 가정한 儒敎라는 카테고리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교라는 카테고리로 자신을 정의하는 다양한 사상과 시스템들이, 동아시아의 사회에 제공하였던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정치적 어젠더로서의 朱熹 (1130-1200) 의 "學"과 士大夫 사회의 형성, 민병희, Harvard University.
儒家는, 그 어느 학파보다도 이상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며, 나아가 인간은 어떻게 판단, 처신, 행동하여야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문제에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仁 개념이다. 즉, 유가는 인간의 본성은 仁이며, 따라서 仁의 체득과 실천이 당위적인 인간의 존재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孔子 이전에, 仁은 다양한 개별적인 덕목들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공자는, 仁을 보편적 덕이자, 모든 덕목들의 종합적인 완성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仁의 실천방법으로 주로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지만, 忠恕, 즉 자기정립과 타자정립을 통한 仁을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仁은 우리 마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관 연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孟子의 목적은, 공자학설의 정초였다. 그래서 그는 孺子入井의 비유를 통해, 인간에 순선한 감정인 惻隱之心이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으로 피어난다는 사실을 통해, 仁이 인간 본성임을 증명하였다.
나아가 맹자 이후 분분한 논의만 있어, 仁에 대한 명확한 名義가 정립되지 않았을 대, 주자는 易經과 程子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仁이 天地之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마음의 덕이자 사랑의 이치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요컨대, 유가의 仁 개념은, 공자에 의해 보편적 덕으로 정립되었며, 맹자에 의해 四端에 기초를 두고 인간의 본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나아가 이 仁은, 주자에 의해 형이상학적으로 정초되어, 유가 仁 개념은 완성되었다고 하는 점을 밝혔다.
공자는 仁의 실천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맹자는 四端이라고 하는 심리적 사실에 초점을 두고 인간본성으로서 仁의 존재를 증명하였으며, 주자는 형이상학적 궁극존재인 천지의 마음에서 유래한 마음의 덕으로서 仁의 존재에 초점을 두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피어나게 하는 근거로 정립하였다고 하는 점을 밝힌다. 儒家 仁개념의 변환구조 : 孔子, 孟子, 朱子를 중심으로, 임헌규, 범한철학.
晦庵 朱熹는,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孟子로 이어져 오는 道統을 체계화시켰다. 그의 도통체계는 주체의식의 발로였다.
그의 이러한 주체 발로에는, 民族的 또는 國家的 主體意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民族이나 國家의 理念이나 宗敎的인 主體意識과 같은, 모든 主體意識은 반드시 正當性과 道德性이 缺如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먼저 주자의 탄생을 고찰한 주자의 저술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바로 주자의 주체의식을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尊周攘夷와 주체의식이고, 둘째는 동방 朱子學과 주체의식이다.
첫째의 경우, 中國은 道와 禮樂이 있고, 夷狄은 道와 禮樂이 없으므로, 禽獸와 같이 보았기 때문에, 尊周攘夷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둘째의 경우, 율곡과 우암이 春秋大義에 입각한 尊周攘夷 사상을 전개한 면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즉, 회암 주희의 주체의식에는 夏와 夷를 구분하면서, 先王의 敎化에 依하여 道를 지켜, 종국에는 周公, 孔子, 孟子로 계승되는 도통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회암(晦庵) 주희(朱熹)의 주체의식, 조준하, 공자학.
-하략-
구매가격 : 3,000 원
맑스 철학, 고독한 유령 칼 마르크스의 철학사상
도서정보 : 탁양현 | 2019-01-1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제1장. 맑스철학 一般
實狀, 필자는 共産主義者가 아니다. 그런데도 굳이 ‘지금 여기’에서 철지난 ‘맑스철학’을 지어내는 까닭은, 共産主義나 社會主義를 알지 못하면 資本主義 역시 알 수 없는 탓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를 統治體制의 根幹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양한 不得已가 내재되어 있다.
自由民主主義나 資本主義가 완벽한 이데올로기인 탓에, 그것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나은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革命이나 改革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國際政治的 상황에서, 민족과 국가의 安危을 분별치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첨예한 좌파와 우파, 혹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각 진영은 서로의 이론과 논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고서 眩惑되거나 籠絡당한다면, 그 원통함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실상을 알고서, 오롯한 자기의 신념으로써 선택하였다면, 후회도 없을뿐더러, 혹여 어긋나도라도 그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알지 못하고서 惑世誣民되어 附和雷同하였다면, 그저 억울하고 회피하고 싶을 따름일 것이다.
이는, 먼 역사를 거론할 것도 없이, 日帝强占이나 韓國戰爭의 상황 속에서, 각 個別者들의 不得已한 無知가 초래한 不條理를 回顧하면 쉬이 납득되는 상황인식이다.
필자는 철학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십수년 동안 재학하며, 두 군데의 연구소에도 재직했다. 그러면서도 그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공산주의자와 빨갱이들의 據點인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런 사실을 無意識的으로 외면했는지 모른다.
어쨌거나 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前衛的 前導者인 것은 아니다.
여하튼, 세월이 흐른 후 回想해보니, 왜 필자가 그들과 소통할 수 없어 소외되었는지, 다소 이해가 된다. 가장 근본적으로, 필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빨갱이가 절대다수인 곳에서, ‘빨갱이 아닌 자’는 ‘아무도 아닌 자’이기 십상이다.
필자가 전공삼아 공부한 中國哲學의 경우도 그러하다. 당시 그곳에는 빨갱이-親中主義者로서 중국철학을 대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빨갱이라거나 친중주의자로서의 삶이 그릇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필자는 빨갱이도 친중주의자도 아니다. 그저 동아시아를 주도했던 중국문명 自體에 대해 알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다보니 學位와 硏究費를 무기삼아, 필자를 소외시키며 조작하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연스레 疏遠해질 수밖에 없었다.
십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곳은 共産主義者와 親中主義者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해, 학위논문에 대해 문의했더니, 지도교수라는 자는 당최 납득이 되지 않는 조건을 전제하며, 아주 卑劣한 거부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결국 공산주의자도 빨갱이도 친중주의자도 아닌 자의 학위논문은, 심사조차도 거부한다는 의미였다.
하긴 그런 곳에서 밥줄을 지켜내야 하니, 빨갱이보다 더욱 빨갛게, 어느새 그 분위기에 잘 적응한 듯하다. 그러니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으리라.
여기서 共産主義者는 자기의 신념을 좇는 부류로서, 오롯이 혁명가나 사상가로서 살아내는 자들이다.
반면에, 빨갱이는 공산주의자 흉내로써 비굴한 생존을 도모하는 무리를 지칭한다. 마치 日帝强占期의 잠재적 親日派쯤으로 比肩될 수 있다. 그러니 이에 대해 명료히 분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니, 아무래도 博士學位論文 심사는 여러 여건을 思慮하여, 다른 대학원에서 도모하여야 할 듯하다. 하지만 빈곤한 필자의 형편으로서는, 당최 그 비용을 마련키 어렵다.
하긴 作家에게 박사학위라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왕에 시작한 공부를 박사수료에서 마감하려니, 객관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듯하여, 다소 찜찜할 따름이다.
-하략-
구매가격 : 3,000 원
헤겔 철학, 서양문명 최후의 근대인 헤겔의 철학사상
도서정보 : 탁양현 | 2019-01-1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제1장. 헤겔철학 일반
Hegel哲學을 讀書하다보면, 朱子哲學나 栗谷哲學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다보니, 老莊哲學이나 Nietzsche哲學을 신념하는 필자로서는, 다소 낯설거나 어색하기도 하다. 하지만 헤겔철학이 지닌 깊음과 너름은 是認치 않을 수 없다.
一言以蔽之하여 Hegel은 西洋文明의 朱子이며 栗谷으로서, 古代로부터 近代에 이르는 서양문명의 精神性과 文明性을 集大成한 者이다.
헤겔에 의해 近代까지의 서양문명이 집대성된 후, Nietzsche에 의해 서구적 現代文明이 開幕된다. 그러니 最後의 近代人 헤겔에 의한 정돈 이후, 최초의 現代人 니체에 의해, 서양문명은 거대한 변화를 실현한 것이다.
따라서 헤겔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근대까지의 서양문명을 이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근대와 현대의 서양문명 역시 이해할 수 없다. 헤겔을 독서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1770~1831)은 觀念哲學을 대표하는 독일의 철학자다. 칸트의 理念과 現實의 二元論을 극복하여 一元化하고, 정신이 辨證法的 과정을 경유해서, 自然, 歷史, 社會, 國家 등의 현실이 되어, 自己發展을 해가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1770년, 독일 뷔르템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1778년부터 1792년까지 튀빙겐 神學校에서 수학했다.
그 후 1793년부터 1800년까지, 스위스의 베른과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정교사 생활을 했는데, 이 때 청년기 헤겔의 사상을 보여주는 종교와 정치에 관한 여러 未出刊 단편들을 남겼다.
첫 저술 ‘피히테와 셸링의 철학 체계의 차이’가 발표된 1801년부터, 주저 ‘精神現象學’이 발표된 1807년 직전까지, ‘예나 대학’에서 私講師 생활을 했다.
그 후 잠시 동안 독일 바이에른주 밤베르크 시에서 신문 편집 일을 했으며, 1808년부터 1816년까지, 독일 바이에른주 뉘른베르크의 한 김나지움에서 校長職을 맡았다.
그리고 2년 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한 후, 1818년 독일 베를린 베를린 대학의 正敎授로 취임했다.
주요 저서로, 精神現象學, 大論理學, 엔치클로페디, 法哲學綱要, 美學講義, 歷史哲學講義 등이 있다. 1831년 콜레라로 사망했으며, 자신의 희망대로 ‘피히테’ 옆에 안장되었다.
모름지기 헤겔의 철학은, ‘生의 분열’이라는 문제적 상황에서 시작된다. 헤겔은 이러한 분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主觀性과 客觀性의 분열을 말한다.
이때 철학의 과제는, 이러한 분열을 통일시켜, 생의 본래적인 모습인 絶對者를 회복하는 것이 된다.
절대자가 생의 본래의 모습, 즉 주관성과 객관성의 근원적이고 동등한 절대적인 통일이려면, 知 안에서 동시에 인식작용의 형식과 존재의 형식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헤겔에게 있어서 主體는, 자신을 存在者의 總體性, 즉 客觀性으로 아는 동시에, 이러한 객관성의 주관성인 知 즉 理性이다.
이성은 統一이라는 측면에서 절대자와 동일하다. 절대자는 이성과 마찬가지로 총체적이며, 生起/發生(Geschehen)으로서의 운동성이 된다. 이러한 절대자는, 이제 존재의 모든 영역들을 포괄하는 철학의 체계, 즉 진리가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로부터 진리로서의 체계가 시작하는, 헤겔의 철학/學의 始原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일인 절대자의 지평에 있게 된다. 따라서 學의 始原은, 분열의 극복으로서의 주객통일의 모습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始原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헤겔은 칸트의 先驗的 統覺의 종합에서, 주관과 객관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러나 헤겔은, 이러한 칸트의 綜合이 주관에 전제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다시 物自體와 대립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때 헤겔은, 주관과 객관이 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원리로서 절대적 종합을 말한다.
이러한 종합에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립된, 근원적 절대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은 ‘精神現象學’에서의 현상학적 의식의 전개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전개의 결과는, 學의 체계가 출발하는 絶對者의 지평이다. 이러한 전개 과정의 발전단계를 거친 現象學的 意識은, 學의 체계가 출발하는 새로운 지평인 絶對知에로 도달한다.
現象學의 결과로서 絶對知는, 論理學에서는 純粹知로 나타난다. 純粹知는 無規定的 직접성이라는 의미에서 순수존재이다.
무규정적 직접성인 순수존재는, 그것에 어떤 규정도 부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또한 純粹無이기도 하다. 하지만 始原은 엄밀히 말해서, 純粹存在도 아니고 純粹無도 아니다.
始原은 이행으로서의 생성, 즉 절대자의 生起/發生과 같은 운동인 것이다.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명제들의 진리는, 學의 본성에서 드러나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직접적인 것인 최초의 것이 결과와 매개되는 이러한 변증법적 운동은, 진행/진전운동인 원환운동이다. 이 운동은, 시원의 자기전개가 가능하면서, 필연적이도록 근거 짓는다.
이것은 또한 시원에서 아직은 잠재적이지만, 절대자의 자기전개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大論理學’의 始原이 절대자의 운동을 가능적인 ‘an sich’로 드러낸다는 것은, 시원이 주객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평임을 의미한다. 헤겔 철학에서 학의 시원 연구, 김윤정, 이화여자대학교.
-하략-
구매가격 : 3,000 원
좋은 정부
도서정보 : 김광웅 | 2019-01-1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좋은 정부란 어떤 모습인가?”
오만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가면을 벗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정부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 뉴패러다임 정부론
유발 하라리의 지적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심이었던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 정보가 무한정으로 축적되면서 나보다 빅데이터가 나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데이터는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의 신흥 종교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를 하라리는 데이터이즘(Dataism)이라고 표현했다.
데이터가 종교라면 이를 관리할 정부 또한 새로운 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도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는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망상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공직자 모두 낡은 사고방식과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일의 정부를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인 저자가 정부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전방위적 통찰을 『좋은 정부』라는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특히 자신의 전공 분야인 법학, 행정학, 정치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 수학, 문학 등 기초학문까지 아울러 전방위적?미래지향적으로 정부를 해설한 보기 드문 역작이다. 행정학의 대가다운 노학자의 날카로운 지적과 통찰이 매섭다.
관료적 권위주의의 가면을 벗겨 ‘더 좋은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정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망했다.
[오늘의 정부]
관료제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본질과 실체를
기초학문과 뉴패러다임으로 낱낱이 파헤치다
관료적 권위주의란 중병은 정부만이 아니라 대학, 학회, 연구소, 병원, 교회 등도 마찬가지다. 관료 사회에서는 상상력은 제쳐두고 도구적 합리주의에 젖은 채 일방적인 소통을 외친다. 〈제1부 오늘의 정부〉에서는 편견을 덧칠한 눈금 없는 잣대로 오만한 결정을 내리는 관료주의의 행태를 척결하는 것이 좋은 정부로 가는 지름길임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 정부의 관료 문화란 무엇인가? 종교나 다름없는 관료주의란 무엇인가? 관료주의는 척추같이 중추로 순서와 등급이 매겨져 있다. 관료들은 여러 계단을 거쳐 올라가는 것에 목숨을 건다. 끈질기게 올라가려 하고 좋은 자리를 탐한다. 정치인이 표에, 기업인이 돈에 눈이 멀었다면 공무원은 인사에 눈이 멀었다. 계급주의의 DNA를 바꿀 방법이 없다. 이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현장을 모르고, 결정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 줄만 아는 바보가 된다.
● 정부가 세상의 변화를 간과하고 과거에만 머무는 것은 바깥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증거다. 정부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는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쇳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꿈쩍하지 않는다. 쇠그릇 속은 관료들의 계급과 자리만 꽉 차 있다. 정부는 판만 깔아주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내일의 변화를 생각하기는커녕 오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전 부처가 대대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에 인공지능, 바이오, 나노 같은 것은 관련 부처에서 담당하면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한다. 철둥지 속이 그렇게 편한 모양이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 불이나 가스에 질식하는 상황이 오면 누가 구하겠는가.
● 정의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주는 것이고, 능력만큼 노력만큼 필요만큼 갖게 하는 것인데, 권한을 쥔 사람은 내놓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만이 진리라고 착각한다. 정부는 법과 규정만 지키면 정의가 구현된다고 믿는다. 상상의 실재이자 허상에 불과한 법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는 일밖에 없다. 이런 정부 아래에서는 진정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으로 위로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적인 처방을 내려도 우리의 병은 낫지 않는다. 각자도생各自圖生?내 몸을 지키려면 스스로 기초 체력을 길러 면역 체계를 갖추는 길밖에 없다. 정부도 어설픈 처방전 대신 기초를 다지는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 그것은 위보다 아래, 하늘보다 땅에 주목하며 관료적 권위주의를 되도록 줄이는 것이다.
[내일의 정부]
관료가 아닌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조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정부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세상의 변화가 가파르다. 머지 않은 시기에 로보 공무원이 행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제2부 내일의 정부〉에서는 데이터가 지배하는 미래정부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내 마치 미래정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관료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바뀐 세상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질 내일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그러한 상상력이 다가오는 미래정부를 대비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변화로 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 IoT가 주축이 된다. 지능적·의식적 선택이었던 선거뿐만 아니라 입학이나 취업까지 알고리즘이 정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신적 인간인 호모 데우스가 될 때쯤엔 데이터가 새로운 종교로 등장하니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하라리의 생각이다. 이때가 되면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자료(기록)만 쌓인다.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경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통제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정치적 레이더망에는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다.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1세기 때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듯하고, 정부 또한 나라를 이끌기보다 운영하기에 바쁜 행정부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 정부는 지금도 재정 투입과 시설 확충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기업인들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 정신과 능력이 있다고 과신한다. 하지만 이제 부는 사회가 만드는 것으로, 기업과 공동체 문화, 그리고 신뢰와 기대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공유경제와 공유정부를 귀담아들을 때가 되었다. 플랫폼 정부와 공유정부가 활로이다. 정부가 시장보다 못하다면 시장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돕는 자세를 갖추면 된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가 애매할수록 둘은 서로 다른 운영 논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영역과 역할을 고집하는 데서 벗어나 접점을 찾아 공생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 인공지능이 정부로 파고들면 종래의 계서제나 계급제는 큰 변화를 맞는다. 조직이 수평으로 변한다는 것은 알고리즘으로 운영 주체가 따로 없이 누구나 대등하게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장관과 차관 같은 자리가 존속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기존의 습 관과 관행 때문이다.
●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 결정은 알고리즘이 할 수 있다는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정부 행정과 정책 결정, 공무원시험, 대학입학시험, 취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 과정 곳곳에 알고리즘이 파고든다. 정부는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위직에 임명해야 할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을 공직에 뽑아야 할지, 투자할 대상이 어디인지, 개발의 여지가 어디인지 등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척척 답을 준다. 그에 앞서 다양한 모듈을 만들어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도 아닌 몇몇 사람들이 구수회의를 열어 정책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개인별, 집단별, 세대별로 진단하여 미리미리 제시해주어야 한다.
책의 주요 논의 내용
이제 정부가 국가 운영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나아갈 길을 새롭게 조명한 이 책은 정부에 대한 기존의 관리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철학과 수학, 문학, 과학 등 기초학문을 토대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해석했다. 나아가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정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을 다양한 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관료적 권위주의는 본질적으로 눈금이 없는 잣대일 뿐 아니라, 편견과 오만으로 점철되어 기준 없이 이랬다 저랬다 분별 없는 판단(정책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 정부와 국민이 근본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응용현상학자 랄프 험멜의 주장을 인용해 밝혔다. 나라를 움직이는 관료들의 머릿속에는 도구적 합리주의만 팽배하고, 상상력과 실천지(phronesis)가 없는 일방적인 통보와 명령만 있다 보니 국민과 소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라캉이 말하는 타자의 욕망이 우선이며, 율라 비스와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말하는 “내 몸에는 타자의 미생물이 더 많다”는 것은, ‘나’라는 요소 자체가 타자와 공동의 정원을 꾸미고 있다는 것인데 내 주장만 하고 있으니 소통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크 데리다의 말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언어는 없고, 존 서얼도 화자의 의도를 알 수 없으면 소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의도 폈다. 예나 지금이나 비유기체인 관료가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 정부 관료가 영혼이 없다는 것은 정치권과 고위직의 눈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명제에 대해서 현직에 종사하는 관료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혼이 없기로 치자면 기업인이 우선이라고 했다.
● 법과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이반 일리히, 유발 하라리 등의 주장을 빌려, 이를테면 교도소라는 제도 때문에 수인이 생긴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의 주장은, 제도는 숫자로 평가해 본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상상의 질서에 불과한데도 법과 제도에만 얽매여 집착하는 정부를 새로 보자는 뜻이다.
● 정부가 비만증에 걸리면 건강하지 않다는 비유를 다양한 의학 이론으로 설명했다. 국세청은 위, 법무부는 신장 등, 정부의 각 부서를 장기에 빗대 설명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비대해지지 말고 플랫폼만 깔아주거나 시장과 일을 나누어 맡자는 공유정부의 논지를 폈다.
●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집을 빌려 사는 전세권자이다. 정권은 색깔을 달리하지만 정부는 오로지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치적을 인정했듯이, 정부라는 나무는 전 정부의 공과 과가 거름이 되어 자란다. “살아간 사람의 성취 없이 만들어진 세계는 없습니다”라고 설파한 소설가 이문열을 상기한다. 70년 내지 100년의 역사가 바탕이 되어 앞으로 운영될 좋은 정부는 전 정부의 과만 탓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 앞으로 1)자아는 원자로 분열되고, 2)사회적 유대가 상실될 것이며, 3)경제 개념으로 획일화된 문화는 보편적 가치를 잃고 권력으로 환원되고, 4)인간의 존재는 비자아(unself)가 되고, 5)이진법이 아니라 다진법이 되고, 6)조직은 계급보다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지배하게 되어 운영 주체가 없어지고, 7)데이터가 새로운 종교가 된다면, 미래정부는 더 강력한 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료적 권위주의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처방전을 써보았다. 한 예가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없애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리에 맞는 인물을 고르되 공공선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실험으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 끝으로, 진리나 진실을 찾아내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학계의 이론이 온전하지 않아 (노벨 생리의학상 수장자 혼조 다스쿠가 〈네이처〉나 〈사이언스〉 지에 실린 논문의 90%는 거짓이라고 말한 것처럼) 리처드 파인만이 말하듯 현실에 맞도록 자주 고치고 버려야 하며, 진리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는 진지한 노력과 도전정신은 가상하지 않냐는 고트홀트 레싱과 정재승의 말을 강조한다.
◎ 책 속에서
앞으로 뷰로크라시(bureaucracy, 관료주의)는 홀라크라시(holacracy)라는 평등조직으로 변해간다는 의견이 나온 지 오래다. 21세기는 운영 주체가 따로 없이 알고리즘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으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는 기존 인식의 대변환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국가와 국민이 편해지는가를 묻는다. 미래정부를 새 패러다임에서 설계하지 않을 수 없다.
_ p. 73 〈2.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료 문화 Synopsis〉 중
세상에서 가장 오래 된 직업은 샤머니즘이고, 그 다음이 관료라는 말이 있다. 기록한다는 것은 또한 새 종교가 될 ‘데이터이즘’의 기초가 된다. 기록하고 분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기록이라는 자료가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정보가 된다. 요리 실력이 좋을수록, 레시피가 좋을수록 필요한 정보가 된다. 새로운 정보는 또 다른 기록이 되어 관리된다. 이들이 반복되며 빅데이터가 되고 관료의 손에서 요리된다. 빅데이터가 커질수록 더 탁월한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데이터는 인간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의 신흥 종교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관료의 손에 맡겨짐으로써 정부가 새로운 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_ pp. 94-95 〈관료, 유기체인가 무기물인가?〉 중
현재의 문제를 현재의 틀로만 보면 해답이 없다. 인간은 어차피 틀 속에 있어 안온하겠지만, 문제투성이의 틀 속에서 마냥 시간만 보낸다면 인생은 허무해지기 마련이다. 틀 밖에서 틀 안을 관조하며 나를 다시 생각하면 된다. 정부도 기존의 관습대로 법,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바꾸어 틀을 더 투명하고 유연하게 만들고 이 틀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좋게 하는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미래에 바뀔 정부도 현재의 틀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해선 안 된다.
새로운 형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틀을 확 바꿔야 한다. 새 판(new paradigm)을 짜야 한다. 기존의 같은 틀 안에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틀은 오래될수록 물이 새게 되어 있다. 미래정부를 염두에 두어야 할 논거들이다.
_ pp. 210-211 〈틀에서 벗어나 새 판을 짜야 한다〉 중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상상의 질서에 불과한 법과 제도로 국민을 제어해야 질서가 잡힌다는 인식은 옛날이야기가 되고 있다. 기껏 국민을 흰쥐 실험하듯 하고 감미료가 잔뜩 들어간 정책으로는 국민의 건강만 해치고 마음을 사지 못한다. 보통 정치인들은 힘만 생각한다. 정의를 표방하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은 전혀 모른다. 힘과 함께 가야 할 기(氣)의 중요성을 모른다. 힘과 기가 모두 올발라야 한다는 말이다. 물리력에 빗댄다면 믿기·열기·나누기·받들기가 ‘4기(四氣)’다. 진동이자 울림으로 국민에게 문을 열고, 믿게 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떠받들어 감동하게 하는 것, 기력을 합친 것이 5차원 정치다.
_ p. 215 〈정의를 망치는 게 정치다〉 중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을이 되겠다는 심정과 각오로 민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보조금 찔끔 주고는 매사를 간섭하고, 농락하고, 억압하는 시대의 관행부터 거두어야 한다. (……) 공유정부와 더불어 함께 가야 할 정부의 기본 정신은 플랫폼 정부다. 정부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새 판만 깔아주면 된다. 공유정부가 미래정부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현재의 반응은 미미하다. 그러나 정부가 다이어트로 건강해지는 길은 공유정부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_ p. 385 〈공유정부로 가는 길〉 중
흔히 로봇이 공무원의 일을 얼마나 맡을 수 있느냐를 궁금해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문가 21인의 의견을 분석한 것을 보면, 정부 행정 관리자가 하는 일의 57%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와 공공행정 전문가는 65%의 일을 로봇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공공단체 임원들이 하는 일의 54%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_ p. 417 〈계급이나 서열이 없어질까?〉 중
로보 공무원의 하루는 어떨지 상상해보자. 그들은 집에서 출퇴근할까? 휴가는 갈까? 휴식은 어떻게 취할까? 어디서 근무할까? 책상은 있을까? 승진 경쟁을 할까? 자기네끼리 회의는 어떻게 할까? 로보 공무원은 집에서 출퇴근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집과 직장은 같은 곳이다. 잠은 자지 않겠지만 휴식은 취할 것이다. 조용히 명상하며 창조적 일을 구상할 것이다.
이들은 어떤 일을 맡게 될까? 이들이 맡을 일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 몫이다. 초기엔 기존 관료들이 이 일을 담당할 것이다. 로보 공무원에게 맡길 일의 종류는 다양하다. 사람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임무의 중심은 이들에게 옮겨갈 것이다. 로보의 숫자를 어느 정도 유지할지, 부처끼리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는 앞으로 설계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반인간, 반기계와 함께 공존할 마음과 하드웨어를 준비해야 밝은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한다.
_ p. 424 〈로보 공무원의 하루〉
구매가격 : 20,000 원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도서정보 : 레이 해밀턴 | 2019-01-1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나를 무식하게 만들지 않을 상위 88%의 지식
지금보다 조금 더 유식해지는 이야기만 담았다!
이 책은 영국 남자 레이 해밀턴이 자신의 책을 고른 당신이 다른 이보다 조금이라도 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온갖 세세한, 오히려 잡다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지식을 모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책을 썼을까? 당신이 옆에 있는 누구보다 조금 더 지적인 사람이 되고자 바랐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교 모임에서 대화의 중심이 당신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레이 해밀턴은 여행과 언어학, 역사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 작가이자 편집자로 정치나 역사, 스포츠, 암흑가의 폭력, 조류 관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더불어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파리에서 다자간 정부 협상을 진행한 적도 있다. 그만큼 박학다식한 그가 자신의 지적인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갈 리 없다. 그래서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책이 바로 『쓸데 있는 신비한 잡학 사전』이다.
구매가격 : 8,91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