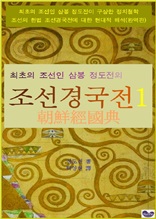인문학 여행자의 동아시아 여행기
도서정보 : 탁양현 | 2018-07-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다소 느린 여행길
인생은 코뿔소의 외뿔처럼 홀로 가는 여행길이라는 말들을 쉬이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홀로 가는 이는 드물다. 혼자서 가는 인생길은 어울려서 가는 인생길보다 몇 갑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홀로 떠나는 코뿔소의 외뿔과 같은 인생길을 애써 외면한다. 애당초 그러한 인생길은 실현될 수 없으며, 실현되어서도 안 되는 것인 양 지레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그런데 그 길은, 고통스러운 고립의 소외가 아니라, 여유로운 고독의 동반이다. 막상 그러한 길을 걸어본 자는 안다.
코뿔소의 외뿔처럼, 홀로 여행하는 자는 여행자다. 떼로 무리지어 다니며 여행하는 자는 관광객이다. 여행자는 결코 관광객의 틈에 끼일 수 없다. 그리고 관광객은 결코 여행자일 수 없다.
그나마 관광객으로서 관광여행이나마 떠나볼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 축에 든다. 관광여행마저도 훌쩍 떠나볼 수 없는 것이 서민대중의 삶이다. 실로 그런 것이 인생이다.
먼 옛날 노자老子는, 삶의 여행을 마치고 함곡관函谷關을 넘어서며, 인류의 지혜서인 도덕경道德經을 남기고서는 홀연히 영원한 여행길에 올랐다. 공자孔子는, 평생을 혼탁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상갓집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유천하周遊天下의 여행길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의 탐사여행이나, 김삿갓 김병연金炳淵의 음유吟遊여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Jesus와 사도 바울Paul의 전도傳道여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여행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야말로 일생 동안을 여행길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역사 안에는 숱한 여행자들이 등장한다. 그런 여행자들의 여행길을 역사는 기억한다. 그것은 그들의 여행이 누구나 쉬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원전 500년. 한 젊은이의 여행이 시작된다. 현재에 이르도록 무수한 인류를 아주 느린 여행자로서의 사색과 고뇌 속으로 이끌어 가는 싯다르타Siddhārtha의 여행이다.
붓다인 싯다르타의 여행은 참으로 웅건하며 현묘한 여정이었다. 그래서 여행길의 끝자락에서 싯다르타는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깨달은 자로서의 붓다buddha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래의 붓다들이 여행을 시작한다. 여행길에 나선 여행자로서의 삶은 그들을 궁극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여행자가 그러한 궁극의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여행길을 두려워한다. 여행자로서 살아내는 일을 꺼린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모른 척 여행의 불안으로부터 정착의 안정 속으로 도피한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여행에의 동경을 지닌다. 그러한 동경은 인간인 탓에 지닐 수밖에 없는 인간존재의 본성이다.
많은 이들은 삶이야말로 가장 빠른 여행길이라는 말을 한다. 맞는 말이다. 이 글을 적어내고 있는 여행자 역시 여전히 유년의 데미안Demian을 추억하고는 있지만, 이미 청춘의 시절은 훌쩍 지나가버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는 감옥으로 가고, 누군가는 직장으로 간다. 누군가는 삶으로 가고, 누군가는 죽음으로 간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여행길을 나선다. 새 날을 맞으며 새로이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여행자는 늘 여행길을 나선다. 매 순간 여행길은 여행자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실현된다.
찰나를 담아내는 사진처럼 여행하는 일은 순간의 미학이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면 결코 여행자가 될 수 없다. 매 순간 여행길에 나서는 자는 매 순간을 체험한다.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 이러한 사유思惟와 체험體驗의 차이는 사진의 비유로써 쉬이 설명될 수 있다.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면, 사유는 잘 찍은 사진이고 체험은 좋은 사진이다. 그러다보니 잘 찍은 사진과 좋은 사진의 차이를 아는 자는 시나브로 여행자가 된다. 떼 지어 몰려다니는 관광객이 아니라 홀로 떠도는 여행자가 된다.
구매가격 : 3,000 원
장자의 예술철학
도서정보 : 탁양현 | 2018-07-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1장. 장자의 예술철학에 관한 이해 9
1. ‘장자’에 관한 일반적 이해 13
2. ‘장자’에 관한 예술철학적 이해 31
2장. ‘부득이(不得已)’에 관하여 49
1. ‘부득이’의 사회적 원인 55
1) 언어와 지식 59
2) 외물(外物)과 욕망 69
3) 생사(生死)와 감정 81
2. ‘부득이’의 문화적 원인 91
1) 상대성과 도덕성 93
2) 유용성과 무용성 103
3. ‘부득이’의 상황 113
1) 빈곤과 불행 117
2) 질병과 장애 129
3) 경쟁과 전쟁 137
3장. ‘소요유(逍遙遊)’에 관하여 149
1. 미학적 ‘소요유’ 153
1) ‘마음의 정갈함[心齋]’과 ‘모두 잊음[坐忘]’ 157
2) ‘만물의 변화[物化]’와 ‘생명을 기름[養生]’ 169
3) ‘만물의 시초에서 노니는 마음[遊心於物之初]’과 ‘지극한 아름다움과 지극한 즐거움[至美至樂]’ 181
4) ‘울타리 바깥에서 노닒[遊外]’과 ‘조짐조차도 없는 노닒[遊 无朕]’ 193
2. 예술적 ‘소요유’ 205
1) ‘칼의 노닒[遊刃]’과 ‘스스로 체득함[自得]’ 207
2)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음[無待]’과 ‘순박함으로 돌아감[復 歸於朴]’ 215
3) ‘신의 경지[疑神]’와 ‘늘 그러한 자연스러움[常然]’ 223
4장. ‘부득이’와 ‘소요유’의 ‘동시적 변화성’ 233
1. ‘동시적 변화성’의 철학적 기원 241
2. 예술적 사유방식으로서 ‘동시적 변화성’ 251
3. ‘장자’가 추구하는 ‘동시적 변화성’ 261
구매가격 : 4,000 원
장자의 철학사상 장자철학
도서정보 : 탁양현 | 2018-07-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삶이라는 예술적 놀이
아무래도 사는 일은 죽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삶은 예술적이고 죽음은 미학적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은 일종의 선시禪詩다.
선시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시 속 화자는 산을 산이라고 했다가 이내 산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산이라고 한다.
언뜻 살피면 이러한 표현은 지극히 비논리적이다.
시 속 화자가 지칭하는 산이기도 하고 동시에 산이 아니기도 한 대상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산이었다가 산이 아니었다가 다시 산이 되는 대상 역시 그러하다. 그 대상이 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시는 미학이나 예술철학의 정체성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과학의 단계다.
관찰과 실험으로써 검증된 실제의 현실만을 현실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오직 실제적인 현실만을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으로써 드러나는 세계는 지극히 현상적이며 표면적이다. 인간존재가 감각하는 현실세계는 대부분 이러한 단계에 있다.
다음으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는 철학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표면적인 현상 이면의 본질을 사유한다. 겉이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심하고 부정하며 회의하고 비판함으로써 참된 진리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예술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 미학과 예술철학이 작동한다. 이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넘어서서 긍정과 부정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가장 위대한 긍정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줄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와 마지막 줄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그 문자적 형태만 동일할 뿐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만약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는 아직 철학을 시작하지 않은(못 한) 것이다.
마지막 줄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인식하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어떠한 삶의 상황 안에서라도 노닐 수 있게 된다.
바로 소요유逍遙遊의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장자의 예술철학은 이러한 소요유의 상태를 지향한다. 따라서 장자의 예술철학은 곧 소요유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자莊子(BC369~BC289)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천 3백여 년 전 고대 중국에 살았던 철학자다.
그 시대는 일명 전국戰國시대다.
전국시대는 온 나라가 전쟁을 하는 시대라는 의미다.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자는 철학을 한 것이다.
장자의 고향은 송宋나라의 몽읍蒙邑이다.
몽읍은 현재의 하남성 상구현 부근이다. 그의 본명은 주周다. 그래서 장자를 장주莊周라고도 지칭한다.
장주는 잠시 옻나무 재배지인 칠원漆園의 관리자로서 일했다.
하지만 칠원에서의 칠원리漆園吏 생활 이후 평생 벼슬길에는 나서지 않았다.
장자의 저작으로 알려진 텍스트 장자는 원래 52편이었다.
그런데 많은 고대의 텍스트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그가 직접 저술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다.
현존하는 33편은 진대晉代 곽상郭象의 편집본이다. 그래서 위진남북조시대의 곽상이 편집한 판본을 흔히 통행본으로 인식한다.
곽상이 편집한 장자 33편은 내편內篇 7편과 외편外篇 15편과 잡편雜篇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내편 7편은 장자가 직접 저술한 진작眞作으로서의 원형에 가까우며 외편 15편과 잡편 11편은 후대의 후학들에 의해 저술된 위작僞作이나 가작假作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 텍스트는 장자의 비극미학과 감성미학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아가 장자라는 텍스트를 노닐듯이 살핌으로써 이를 통해 어떤 예술철학의 모습을 그려 보이고자 한다. 그것이 곧 장자의 철학이다.
장자의 미학은 사유思惟의 미학이며 장자의 예술철학 역시 사유의 예술철학이다.
이러한 사유들은 다양한 사유방식을 통해 예술적인 행위(체험)로써 표현된다. 그러한 실천적 표현은 예술가적인 인간존재의 삶 그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생성해 낸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긍정을 지향하는 소요유로써 그려내는 삶 자체로서의 예술작품이다.
철학은 모두를 위한 학문이다.
그러나 철학함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 철학하고 있는 자만을 위해 작동한다.
장자의 철학은 소요유逍遙遊라는 예술철학적인 정신성의 지평 위에서 작동한다.
소요유는 삶 그 자체를 오롯이 시인하고서 그것을 예술가적인 변화로써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실현해내는 일이다.
또한 소요유는 철학함으로써 예술함을 실현해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가장 철저한 인식으로서의 정신(마음)을 작동시키기 위해 철학함을 선택하는 일이다.
곧 이미 예술함을 선택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역사 안에서 소요유의 예술정신은 현재에 이르도록 흔히 체념이나 초월의 정서로서 분별되곤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두 편의 시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체념의 정서를 드러낸 조광조趙光祖의 ‘전라도 화순에서의 귀양살이’[綾城謫中]라는 시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화살 맞은 새와 같은 나의 신세 누가 가여워 해줄까.[誰憐身似傷弓鳥]
말을 잃은 노인의 마음만 같아 저절로 웃음 짓네.[自笑心同失馬翁]
원숭이와 학은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성을 낸다네.[猿鶴定嗔吾不返]
이미 엎어진 독 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그들이 어찌 알겠는가.[豈知難出覆盆中]
조광조는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조선의 변혁을 선도한 개혁가이며 사상가이다.
하지만 그러한 혁명적 개혁을 수용할 수 없었던 기존의 집단권력이 모의한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의해 현재의 전라도 화순 땅인 능주綾州로 유배되어 한 달 만에 사약을 받고서 사형을 당한다.
이 시에는 그러한 입세간入世間의 상황 속에서 이미 삶을 체념하고서 자기의 내면으로 깊숙이 침잠한 채 죽음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그의 심리상태가 잘 드러나 있다.
조광조는 실로 독실한 유학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집단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후에는 노장철학의 정서에 귀의한다는 것은 동아시아문화권의 역사 안에서는 아주 익숙한 현상이다.
특히 ‘스스로·저절로 웃음 짓는 마음’[自笑心]이라는 표현에는 장자철학의 소요유逍遙遊에서 이르는 생시生視 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한산寒山의 ‘장자가 이야기하는 죽음’[莊子說送終]이라는 시다. 한산 역시 여기에서 장자의 입을 빌어 죽음의 상황에 대한 체념을 노래하고 있다.
장자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네.[莊子說送終]
그는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겠다고 했다네.[天地爲棺椁]
나도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것이네.[吾歸此有時]
결국 한 번은 갈대로 엮은 박 위에 눕게 될 것이네.[唯須一番箔]
무릇 죽음이란 어린 파리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이라네.[死將喂靑蠅]
그러니 조문할 때 하얀 학처럼 너무 조아리지는 말게.[吊不勞白鶴]
백이와 숙제처럼 수양산에서 굶어죽음으로써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네.[餓著首陽山]
그러나 삶을 살피고서 죽음 역시 살펴야만 편안할 수 있을 것이네.[生廉死亦樂]
한산은 당唐나라 때의 승려이자 시인이다. 그가 천태산天臺山의 한암寒岩이라는 바위굴속에 은둔하며 살았던 탓에 한산이라고 불린다.
그는 현실세계로부터 일탈한 채 고립과 은둔의 출세간出世間의 상황에 머물렀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에 드러나는 정서는 지극히 비판적이며 초월적이다.
불교가 처음 중국에 유입되던 시절부터 대체로 불교철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역사 안에서 지극히 초월적인 소요유의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이 시에서 역시 삶을 살피고서 죽음 역시 살펴야 한다는 대목에 장자철학의 소요유逍遙遊에서 이르는 상망相忘 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장자의 철학에서 소요유의 예술정신은 인간존재의 살아냄이라는 삶의 과정 자체와 따로 떼어진 상태의 어떤 무엇이 아니다.
장자가 이르는 예술적인 상황은 예술가적인 인간존재의 삶의 현실 그 자체다.
따라서 위의 두 편의 시에 표현된 체념이나 초월의 정서보다는 천지자연 안에서 스스로·저절로 그러하는 초연超然이라는 정서에 보다 근접한다.
이는 입세간入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이라는 비동시적인 상황의 시중적時中的 ‘사이’[間]에서 동시적으로 머물 수 있을 때 가능한 경지다.
조광조의 경우처럼 입세간의 상황에서 체념한다거나 또는 한산의 경우처럼 출세간의 상황에서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소요유는 삶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사이’에서 노닐 수 있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요유는 곧 온갖 굴레와 갖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다. 그리고서는 그러한 자유와 해방으로부터도 초연해짐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극히 미학적이며 예술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요유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존재의 모습은 지극히 예술가적이다.
후대에 소요유의 예술정신은 다소 극단화되어 방종이나 와해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소요유의 자유와 해방이 극단적인 방종이나 와해적인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자의 예술철학이 이르는 자유와 해방은 현실세계의 온갖 부득이함까지도 죄 수용하는 소요유의 깨달음과 실천이다.
이로써 실현되는 삶 자체로서의 예술은 소요유에 대한 철학적인 깨달음과 예술적인 실천을 통한 물아일체로써 가장 위대한 긍정을 지향하는 살아냄 그 자체다.
장자에는 장자 스스로의 철학적(인문학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장자의 대답을 발견하는 일은 이제 독자의 몫이다.
그런데 그 대답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서 이미 결정된 정답이 아니다. 때문에 아마도 각 독자는 소요유에 대하여 각자 저마다의 답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마다의 대답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요유의 노닒으로써 장자의 예술철학에 다가서는 올바른 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가격 : 3,000 원
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1
도서정보 : 정도전 지음(탁양현 옮김) | 2018-07-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최초의 조선인朝鮮人 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1
역사歷史의 과정에는 어떠한 단절도 없다. 혹여 역사 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단절적 사건이라도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예컨대 토마스 쿤Thomas Samuel Kuhn이 논변하는 과학적 패러다임paradigm(틀)의 변화적 원리가 역사의 측면에서는 일견 단절의 현상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 역사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개벽開闢이나 혁명革命에 가까운 극단적인 단절적 변화의 일면을 내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가 작동하거나 역사를 작동시키는 본래적인 원리 자체가 달라지는 현상인 것은 아니다.
현실세계의 온 인간존재가 동일한 종種으로서의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듯 역사는 스스로·저절로 그러하는 천지자연天地自然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편普遍(universal)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한다.
이러한 보편의 원리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여서 착각하고 있듯이 통합統合이나 통일統一 등에 기반을 두는 그림자권력적인 동일성同一性(identity)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의 원리는 현실세계의 온 존재와 온갖 것들이 본래적으로 서로 닮아있는 닮음의 유사성類似性(similarity)을 의미하며 외려 그러한 보편은 모든 차이差異의 바탕 위에서 작동한다.
여하튼 여기서 현실세계의 역사가 인간중심주의적人間中心主義的인 존재자로서의 인간존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인지 천지자연중심주의적天地自然中心主義的인 존재자로서의 인간존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인지를 논변코자 함은 아니다.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은 조선朝鮮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실질적인 설계도다. 따라서 조선경국전을 살피면 조선이라는 왕조국가王朝國家의 본래적인 모습 자체를 알 수 있다.
최초의 조선인들이 조선이라는 왕조국가를 어떠한 사유방식思惟方式으로써 구조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이라는 왕조국가가 어떠한 이념理念으로써 작동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조선경국전은 애당초 굳이 이런저런 주석註釋이나 해설解說을 덧붙이지 않은 본문만으로도 그 의미와 의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술記述된 텍스트text다.
다만 원전原典이 한자漢字로 기술되어 있고 그에 대한 번역어가 한문 투인 탓에 기존의 번역서가 현대인들에게 낯설 따름이다.
이에 역자譯者는 현대의 독자讀者들이 그 본문만을 독서하더라도 그 텍스트 자체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어투로써 번역하고자 하였다.
구매가격 : 3,000 원
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2
도서정보 : 정도전 지음(탁양현 옮김) | 2018-07-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최초의 조선인朝鮮人 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정도전鄭道傳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혁명가이며 사상가였다.
그러한 그가 혁명과업의 완수 이후에는 가장 보수적인 수구守舊세력이 되었다. 이렇듯 진보進步는 동시적으로 보수保守다.
현실세계에서 진보나 보수가 가름되는 것은 다만 상황의 문제일 따름이다. 이는 고금古今과 동서東西를 막론하고서 현대에 이르도록 지극히 일상적인 역사의 법칙적 원리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에서 곧잘 주周나라의 문화나 공자孔子의 발언을 인용한다.
주나라의 문화를 본받으려고 하는 점은 공자와 닮았다. 아마도 삼봉三峰은 스스로 조선의 공자이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공자는 호학자好學者이며 철학자로서 성인聖人이었다. 그런데 삼봉은 사상가이며 혁명가로서 철저한 정치가였다.
그래서 조선경국전은 응당 논어論語이지 않다.
그리고 정도전은 주역周易을 인용하기도 한다.
이 또한 공자가 주역을 삼천 번이나 읽어서 주간竹簡의 가죽 끈이 닳을 정도였다고 하니 마땅히 공자가 주역에서 천지자연의 근본원리를 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봉이 인식하는 주역철학은 어디까지나 동중서董仲舒의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하다’[陽尊陰卑]는 식의 사유방식을 좇는 것이므로 본래의 주역철학이나 공자철학의 사유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현실세계의 표면으로 양陽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서 음陰이 비동시적인 동시성으로서의 토대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음과 양은 어떤 본질적 실체로서 고정된 불변태不變態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생성’[相生]하며 동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극복하는’[相剋]하는 교차적 변화로써 순환하는 변화태變化態다.
이는 동중서가 음양의 관계를 유가儒家 통치철학의 핵심 개념인 천명天命이나 천자天子 등을 작동시키기 의한 통치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유용하도록 ‘양陽인 군자君子(지배계급)는 존귀하고 음陰인 소인小人(피지배계급)은 비천하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갖는 사유방식이다.
따라서 동중서가 당시 집단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급주의적인 통치이데올로기로써 주역철학의 음양의 사유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유가철학은 현재에 이르도록 여전히 주역철학의 음양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동중서의 양존음비陽尊陰卑 식의 사유방식을 고집하며 추종한다.
이외에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이나 맹자孟子나 대명률大明律 등의 전거典據들의 경우 역시 그러하다.
구매가격 : 3,000 원
주역철학
도서정보 : 탁양현 | 2018-07-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주역周易철학
흔히 인간존재의 삶은 고통이라고들 한다. 출생 이후 죽음의 순간까지 생로병사生老病死에 얽매인 채, 고달픈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삶의 과정 자체의 고통스러움이야, 굳이 말할 바 없다.
그런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살아내는 동안 이런저런 인연으로 인해 관계를 맺게 되는 주변의 온갖 인간존재들로부터, 인간존재에게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잔혹함을 체험하게 될 때이다.
만약 인간이 다만 동물적 차원에 머무는 존재라면, 그러한 잔혹함이 별반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저 자기自己의 이득을 위해 손해되는 온갖 대상을 적敵으로 삼고서 잔혹하게 제거해버리면 될 테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동물적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적어도 넘어서려고 하는 탓에 인간일 수 있는 것 아니던가.
삶의 과정 안에서 인간존재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타자他者들은, 본성적인 잔혹함을 결국은 드러낸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삶의 부득이不得已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와 타자가 죄다 애당초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본래적인 본성이다. 그래서 결국 삶을 살아내는 동안 모든 인간존재는 숱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 것이 인간존재로서 어찌 할 수 없는 삶의 부득이라면, 이제 인간존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현대의 가장 유력한 심리학자 중의 한 사람인 칼 융Carl Gustav Jung은, ‘상처 입은 자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삶의 모습은 달라진다.
예컨대 철저히 개별자個別者나 주관적主觀的인 관점에서 마음의 상처를 초월하거나 승화할 수도 있다. 또는 철저히 집단자集團者나 객관적客觀的인 관점에서 마음의 상처를 억제하거나 억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은 마음(정신)의 심리적인 상처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가장 일상적이며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만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철학(인문)치료자의 태도를 갖기는 어렵다.
개인을 우선하는 주관적인 태도나 집단을 우선하는 객관적인 태도는 모두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존재자는 개별자나 공동체의 관점보다는, 그 마음 안에 자신의 관점만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치료자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어떤 관점을 제시하려는 억지스런 의도보다는, 내담자來談者 스스로가 자신의 상처를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어야 한다.
마음에 상처 입은 존재자들은 적어도 그 상처를 서로 공유하기만 하여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말을 진실로 경청해주면서 그 속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준다면 대부분의 상처는 나아질 것이다.
현대적인 마음의 병들은, 대부분 각 개별자로서의 인간존재가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현상은, 각 개인들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격에서 비롯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사회구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각 개인의 문제는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는다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不得已]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심리학이나 종교학이나 정신의학 등은 개인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둘 뿐,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 등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해명할 뿐, 개인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외의 많은 분과 학문들 역시 이러한 형태의 한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 하다.
그렇다면 사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시대와 상황 속에서, 각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철학의 바깥에 있지 않다.
현대철학의 가장 유력한 실존주의자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철학입문Einleitung in die philosophie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한다.
우리가 결코 철학의 바깥에 있지 않음은, 우리가 철학에 관한 어떤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철학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 해도, 우리는 이미 철학 안에 있다. 왜냐하면 철학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자신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항상 이미 철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굳이 철학하지 않아도 이미 철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가끔 철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실존하는 한 언제나 필연적으로 철학한다. 인간으로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곧 철학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물은 철학할 수 없다. 그리고 신God은 철학할 필요가 없다. 만약 신이 철학한다면,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철학의 본질은 한 유한 존재자로서의 인간존재의 유한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존재는 이미 ‘철학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발언처럼, 인간으로서의 현존재 자체는 그 본질상 우연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미 철학 안에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인간존재는 서로 상이한 가능성과 다양한 깨어 있음의 단계와 정도를 가진다.
때문에 그에 따라 철학 그 자체는 감추어져 있거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정치나 경제 등의 각종 다양한 방편으로써 드러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철학으로서 인식되지 않을 따름이다.
‘철학’이라는 대상과 ‘철학함’이라는 행위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인간존재가 철학하려는 까닭은 철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의 바탕 위에서 철학하는 행위 자체가 ‘철학함’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둘은 경중輕重이나 우열優劣이나 선후先後 따위의 이분법적 도식으로써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되지도 않으며 분리될 수도 없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하나이지만 하나이지 않고 둘이지만 둘이지 않은’ 비동시적 동시성의 지평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현실세계의 온갖 ‘철학함’은 아무런 사전 전제도 전제하지 않는 무전제無前提로부터 시작된다.
주역周易의 사유 역시 그러한 무전제로서의 무극無極인 태극太極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무극으로 되돌아가는 순환과 변화의 과정 안에서, 결코 아무런 전제도 하지 않는다.
이는, 혹자들이 왜곡하여 오해하듯이, 요행을 바라거나 우연에 기대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추구하는 결과가 아니다. ‘스스로·저절로 그러하는’[自然] 천지자연이라는 이 우주 자체의 법칙적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역의 원리는, 주역철학周易哲學이나 삼현철학三玄(易․老․莊)哲學으로써 철학(인문학)적인 상담·치료를 추구하며 실현코자 하는 철학치료자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사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는 흔히 세 가지 형태의 시공간이 존재한다.
이데아와 같은 이상향적理想鄕的 시공간과 이미지와 같은 초세적超世的 시공간과 실제적 현실세계인 세속적世俗的 시공간이 바로 그것이다.
이상향의 시공간은 ‘텅 빔’[無]의 토대다. 인간존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고향이라서 이상향理想鄕이다. 또한 어디에도 실재하지 않는 유토피아Utopia이므로 ‘텅 빔’[無]이다.
유토피아라는 개념 역시 그리스어의 없는ou- 또는 좋은eu-에 장소toppos라는 말을 결합하여, 토머스 모어Thomas More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좋은 장소란 의미다.
반면에 세속의 시공간은 유有의 토대다. 세계가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곳이라서 세속世俗이며, 실재하여 나타나므로 현실現實이다. 그런데 과연 이 셋 중에서 인간존재가 실제로 머무르는 시공간은 어디일까?
아마도 대부분은 쉬이 실제적 현실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라도 잠시만 되짚어 생각해 보면, 인간존재는 결코 현실적인 세속의 시공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인식하게 된다.
분명 실제적으로는 현실의 세속에 속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이상향을 꿈꾸는 동시적이며 이중적인 실제와 초월의 사이적[間的] 시공간에 머물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인간존재는 세속의 시공간에만 있는 것이라고 단언한다면, 그는 분명 정신(마음)과 육체(몸)를 분리하여 사유하는 것이다.
정신으로부터 분리된 육체라면 충분히 세속의 시공간에만 머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정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실재하지 않으니 없는 것인가?
몸과 마음으로서의 인간존재는, 없음도 아니며, 없지 않음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며, 있지 않음도 아닌, 그 사이[間]에 머문다. 부득이하므로 몸의 현실에 토대를 두면서도, 늘 영혼의 이상향으로 비상하는 이중적 사이의 시공간에 있는 것이다.
또한 삶과 죽음 사이, 시간과 공간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 아이와 어른 사이, 신과 악마 사이, 하늘과 땅 사이. 그러한 온갖 변화와 순환 사이에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존재들은 자신이 그러한 사이에 있다고 생각되면 아주 불편해 한다. 적어도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이에서의 선택과 불안보다는 소속에서의 확신과 안정 속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편에도 확고히 소속하지 못한/않은 채 사이를 떠도는 자라면, 누구라도 이내 방랑자나 이방인으로 간주해 버린다. 사이의 시공간은 아무래도 잠시 떠도는 곳이지, 오랫동안 머무는 곳은 아니라고 여기는 탓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안에서 생성적이며 창조적인 변화는 오히려 그러한 사이에서 비롯하였다. 때문에 그러한 사이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주역의 원리를 깨닫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마음(동시적인 몸)에 상처를 입어 상담이나 치유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의 대부분은 늘 그러한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으므로, 특히 철학상담자나 철학치료자는 그런 모든 사이를 배려하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는 곧 철학적(인문학적) 상담·치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가격 : 3,000 원
중용 주자의 중용장구
도서정보 : 자사 | 2018-07-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中庸 : 치우침 없는 일상
‘중용’은, 모름지기 명실상부 중국문명 최상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이다.
예컨대, 대학원에서 도가철학을 전공한 필자로서는, 자연스레 유가철학의 텍스트들을 비판적으로 살피게 된다. 그런데 ‘중용’이나 ‘논어’의 경우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외려 ‘노자도덕경’이나 ‘장자’를 독서하는 듯한 감명을 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 가장 대립적인 철학사상을 공부하는 자마저도 감동시킬 수 있는 텍스트는, 결코 흔하지 않다. 아니 너무도 희귀하다. 그런 것이 바로 ‘중용’이다.
오늘날 전해지는 ‘중용’은,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의 ‘중용’편을 송나라 때에 단행본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주자’의 주석에서 여러 차례 거론되듯이, ‘논어(論語)’나 ‘공자가어(孔子家語)’의 가르침을 ‘자사’가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사’의 조부(祖父)이면서 동시에 멘토(mentor)였던 ‘공자’는,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를 실현했다. 이는, 자기의 의지나 욕망을 좇아서 행동하더라도, 결코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공자’의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도록, 세상은 쉬이 ‘종심소욕’ 자체가 애당초 그릇된 것인 양 규정해둔다. 그리고서는 현실세계의 인간존재들을 아예 ‘종심소욕’ 자체가 불가하도록 훈육하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정작 자기의 마음이 무얼 욕구하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린다. 이러한 상황은 21세기의 현대인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으며, 인간존재로서 참으로 비극적인 내몰림이라고 할 것이다.
‘종심소욕’은 ‘공자’와 같은 성인마저도 추구한 바이다. 그래야만 삶이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불유구’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 하다면, ‘종심소욕’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참극을 초래하고 만다.
예컨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각자 자기 마음이 욕망하는 대로 해버린다고 상상해 보자. 아마도 그러하다면, 인류문명은 금세 종말을 고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불유구’할 수 있다는 것은, 삶 안에서 ‘중용’을 잘 실현한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불유구’한다는 것은, 나와 너, 개인과 공동체 따위의 사이에서, 치우침 없는 일상으로서의 ‘중용’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나 ‘공자’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는 없으며, 또 굳이 그러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각 인간존재의 삶은 각자의 몫이며, 각자의 것일 따름이다. 어쨌거나 ‘공자’ 이후로 ‘공자’와 같은 삶을 살아낸 자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종심소욕불유구’는 이르기 어려운 경지인 탓이다. 어쩌면 그래서 ‘자사’는 ‘중용’을 찬술하였던 것이다.
‘중용’의 치우침 없는 일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곧 ‘종심소욕불유구’를 실천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예컨대, 그렇게 ‘종심소욕불유구’에 근접하는 ‘중용’의 가장 극단적인 실현으로서, 삶의 욕망과 죽음의 욕망 사이의 ‘중용’을 말할 수 있다. 서양의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이를 에로스(Eros)와 타나토스(Thanatos) 사이의 중화(中和)라고 했다.
자기보존적인 본능과 성적 본능을 합한 삶의 본능이, 곧 에로스다. 그리고 공격적인 본능들로서 구성된 죽음의 본능이, 곧 타나토스다.
삶의 본능에서 성격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성 본능이고, 이것에 내재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libodo)다. 이러한 삶의 본능은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종족의 번창을 가져오도록 한다.
반면에, 죽음의 본능은 파괴의 본능이라고도 한다. 이는 생물체가 무생물로 환원하려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파괴적 에너지가 바로 모르티도(mortido)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멸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쉼 없이 자신을 파괴하고 처벌하며, 타인이나 환경마저도 파괴시키려고 서로 싸우며 공격하는 행동을 한다. 대표적인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전쟁일 것이다.
삶의 과정 안에서, 이러한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은 서로 중화를 이루기도 하고, 서로 대체되기도 한다. 그러할 때, 서로 중화를 이룬다는 것은, 곧 ‘중용’을 실현한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쉬이 삶은 무작정 좋은 것이고, 죽음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단정해버리고는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금 여기’의 현실세계에서 인간존재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궁극한 ‘중용’은, 모름지기 삶과 죽음의 ‘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삶도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며, 죽음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할 때, 삶은 더욱 삶다워지고, 죽음은 더욱 죽음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삶이란 무작정 좋다고 하기엔 너무나 예술적이고, 죽음이란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엔 지극히 미학적이다. 그래서 ‘중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중용’ 말이다.
인간존재의 삶이란, 제아무리 제 멋에 겨워 떠들어대며 으스댄들, 유학자이면서도 ‘공자’와 ‘맹자’를 조롱하며 비판했던 이지(李贄, 卓吾, 1527~1602)의 표현처럼, 결국은 고작 ‘한 마리 길들여진 개’의 신세에 불과한 듯하다.
‘이탁오(李卓吾)’는 자기가 쓴 책의 제목을, ‘불살라버려야 할 책(焚書)’이라고 지은 인물이다.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것이었는지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분서’에서 ‘이탁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성인의 가르침을 배웠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 한다. 그리고 ‘공자’를 존경하지만, 정작 ‘공자’의 어떤 면이 존경할 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는 난쟁이가 사람들 틈에 섞여 연극을 구경하면서, 앞의 사람들이 잘 한다며 소리를 지르면 덩달아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또 이런 말도 한다.
“그림자를 보고서 개가 짖어대기 시작하니, 곁에 있는 개들도 아무런 전후사정을 알지 못 한 채 무작정 짖어대기 시작한다. 그림자에 놀라서 짖어대는 개를 따라 짖어대는 개들과 나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중국문명 안에서 ‘이탁오’는, 유학자로서 ‘공자’를 조롱하고 또한 ‘맹자’를 공격하고 나아가 ‘주자’마저도 철저히 비판했던, 거의 유일한 사상가이다.
그런데 그런 ‘이탁오’야말로, ‘공자’ 이후 독존유술(獨存儒術)쯤을 내세우며, 유가철학을 한갓 통치적 이데올로기로서나 이용하려는 집단권력에 의해 줄곧 왜곡되고 오염되어 가는, 유학(儒學) 자체의 ‘중용’을 처절하게 실천하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철학을 통치적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독재하게 될 때, 서민대중들의 고통은 실로 극심한 것이다. 예컨대, 그러한 방식으로 500여 년을 통치했던 역사가 바로 ‘조선왕조’다.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조선왕조’의 왕정(王政)은 대체로 사대부(士大夫)들이 주도하는 권력체제였다. 대표적인 사대부 세력으로서 17세기 말엽, ‘숙종’ 초기에 부각되기 시작한 ‘노론(老論)’을 특별히 거론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물론이며, 현대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李完用)’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왕조 말기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그 세력의 당수였다는 것은, 조선의 사대부라는 세력집단의 정체성을 엿보게 하는 지극히 자극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물론 사대부들 전부가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는 순간에, 지역에서 의병항쟁을 하거나, 먼 이국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사대부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21세기 민주정(民主政)의 시대를 살아내는 현대인인 탓에, ‘조선왕조’라는 체제 내에서 서민대중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잘 감각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현재에 이르도록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대식 세습왕조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다소 근접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굳이 필자가, ‘조선왕조’를 북한과 비유하는 까닭은, 현재 북한의 국호가 ‘조선 인민 민주주의공화국(朝鮮 人民 民主主義共和國)’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국호인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대한’은 과거의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취했고, ‘민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에서 취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것처럼, 북한은 국호를 ‘조선왕조’에서 취한 것이다.
그런데 남한이나 북한의 국호 모두 그다지 그럴 듯한 것은 되지 못 한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말할 나위 없으며, ‘대한’이나 ‘민국’이라는 것도 그 이면에 얽힌 역사는, 우리 것이므로 무작정 자랑스럽다고만 하기엔 너무도 깊은 치욕과 회한이 서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탁오’는 그렇게 한갓 통치적 이데올로기로나 일그러져버린 유학사상을 비판했던 것이다.
‘종심소욕불유구’는 물론이며 ‘중용’ 또한, ‘이탁오’처럼 자기의 원초적인 생존적 토대마저도 부정하고 거부해버리는 치열함이 없고서는, 결코 그 실제적인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설령 ‘공자’나 ‘자사’처럼 살아 내거나 ‘이탁오’처럼 살아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삶의 끝 날까지 ‘중용’을 지향하며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실세계의 서민대중으로서 그나마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진솔하고 소중한 ‘중용’일 것이다.
구매가격 : 3,000 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서정보 : 니체 지음(탁양현 엮음) | 2018-07-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차라투스트라Zarathustra는 이렇게 말했다
적잖은 시간 동안, 나의 청춘을 온통 지배했던, 고뇌와 비탄의 철학자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를 여전히 추억한다. 지금껏 여러 이유로,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과 그들의 온갖 사상들을 알고서는 이미 망각해버렸지만, 아마도 내 죽음의 순간까지도, 니체의 추억만큼은 망각되지 않을 듯하다.
니체를 추억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그의 대표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를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제목에 드러나 있는 바처럼, 차라투스트라는 정작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나는, 차라투스트라가 말하려고 했던 최후의 발언은 ‘위대한 침묵’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지금 이 텍스트를 지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다.
많은 이들은, 니체에 관해 이런 말들을 한다.
“비록 깊은 밤 숨죽인 도둑처럼, 니체의 고뇌와 비탄을 슬쩍 훔쳤을지라도, 니체를 읽지 않은 자와의 만남과 대화는 너무나 소모적이다.”
“결국 부득이한 생존을 핑계 삼으며, 니체의 본의本意를 짐짓 모른 체하고 외면해야만 하더라도, 니체를 알지 못 하는 자와 철학이나 문학을 논변論辯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아가 인문학 자체에 대해서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 니체를 기억하거나 추억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21세기는 이미, 굳이 니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뇌와 비탄에 찬 시대인 탓이다.
이제 내게도, 청춘의 시절처럼 니체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전집은 물론이며, 독일어판 원서까지 무작정 뒤적여대던, 무모할 정도의 열정은 이제 없다. 그런데 그렇게 강렬하던 열정이 식어버린 후, 외려 니체는 아주 선명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선다. 참으로 묘한 노릇이다.
누구에게나 니체를 고뇌했다는 것은, 인간존재의 삶 자체에 대해서 참으로 절실히 고뇌했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그래서 일견 니체는 곧, 고뇌 자체다. 무릇 고뇌 자체로서의 니체다.
니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서, 스스로의 고뇌를 차라투스트라의 발언으로써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렇게 니체의 고뇌는, 차라투스트라의 발언으로써 마감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마감의 순간에, 정작 차라투스트라의 발언은 시작된다. 그리고 이후, 차라투스트라의 발언은 줄곧 계속 되고 있다.
차라투스트라의 발언과 차라투스트라의 침묵, 발언하는 차라투스트라와 침묵하는 차라투스트라.
이러한 차이를 안다면, 이제 차라투스트라의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뇌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21세기는, 차라투스트라의 가혹한 발언 이후의 위대한 침묵을 새로이 고뇌해야 할 시절이라고 할 것이다.
구매가격 : 4,000 원
논어 1
도서정보 : 공자(탁양현 옮김) | 2018-07-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인간존재 본연의 감성 에세이
‘논어’가 고금(古今)과 동서(東西)를 아우르는 불멸의 고전이 된 것은, 인간존재 본연의 감성을 참으로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이 난해한 논술의 형식이 아니라, 일상세계의 체험을 담담하게 기술하는 에세이 형식으로써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면서, 근대 이후 한동안 단지 ‘학술을 위한 학술’을 추구했던 서양사회의 인문학적 관성을 좇아, 마치 논문은 아주 고상하며 고급한 글쓰기이고, 반면에 에세이는 아주 유치하고 저급한 것인 양 인식하는 자들이 간혹 있다.
이는 특히, ‘장자’가 들려주는 ‘우물 안 개구리’ 우화에 등장하는 개구리처럼, 상아탑에 틀어박힌 채로 강단학술쯤이나 주도해보려는 자들에게서 곧잘 볼 수 있는 행태이기도 하다.
그런데 필자로서는, 과도한 전문용어나 학술용어 따위를 남발하는 글쓰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여타의 글쓰기에 비해 보다 우월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논어’는 시대를 관통하는 가르침을 안겨줄 것으로 여겨진다. ‘논어’는, 언어를 통한 가장 위대한 소통은 그것이 지닌 진솔함과 소박함에서 기인한다는 본래적인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장자’에는, 제나라 ‘환공’의 책읽기를 비판하는 ‘수레바퀴 장인’의 예화가 기술되어 있다.
이야기 속에서 ‘수레바퀴 장인’은, 애당초 인간의 언어는 그 소통에 있어 본래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언어가 개별자로서의 각 인간존재들 사이에서 작동함으로써 인해 기인하는 한계다.
인류의 다양한 글쓰기 형태 중에서, ‘수레바퀴 장인’이 추구하는 참된 소통의 가능성을 실현해 주는 것은, ‘논어’의 경우처럼 에세이 형식으로써 기술된 텍스트들이며, 어쩌면 논문이라는 형식이야말로 ‘수레바퀴 장인’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가장 대표적인 ‘찌꺼기[糟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필자는 십여 년 동안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난다 긴다 하는 석학들의 무수한 논문들을 독서했고, 또한 필자 역시 자의반타의반으로 적잖은 논문을 기술했다.
그런데 그런 무수한 논문들이, ‘논어’처럼 인간 본연의 감성을 담아내는 소박한 에세이에 비해서, 과연 어떤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인지 당최 의문이다. 나아가, 시나 소설 형식의 글쓰기의 경우도 그러하다.
물론, 논문이라는 학술적 글쓰기 자체가 그릇되었다는 게 아니며, 어지간한 논문이나마 짜깁기해 내기 위해서는 적잖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필자 역시 오롯한 체험으로써 잘 알고 있다. 다만, 그저 논문에만 치우쳐버리는 편중된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논문이라는 형식 그 자체에만 매몰되다보면, 논문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논리성을 갖추기보다는, 그 사유가 한없이 경직되어버리고, 메마른 감성과 핏발선 이성쯤으로나 경도되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학(先學)들의 찌꺼기를 짜깁기해서 치졸한 논문 쪼가리나마 지어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들이라면, ‘논어’를 통해 인간 본연의 인문학적 텍스트가 전해주는 감동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인연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도 ‘좋은 인연[善緣]’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살다보면, 선연보다는 악연이 좀 더 많은 것만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악연을 풀어보려는 의도 자체는 가상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악연이 선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서양의 어느 왕처럼 엉킨 매듭을 과감히 절단해버리는 것만이, 부득이한 악연을 대하는 유일한 해결책인지 모른다.
필자 역시, 삶의 부득이한 악연들의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수없이 해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체험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인지 공자와 제자들의 혈연을 넘어서는 애틋함과 끈끈함이, 지금 여기에서 더욱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듯하다.
‘논어’의 저자는 쉬이 ‘공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논어’를 실제로 기술한 것은 그의 후학들이며, ‘공자’ 자신이 아니다.
이는, 마치 ‘신약’의 4대 복음서들이 모두 그 저자가 다르지만, 죄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기술인 바와 흡사하다. ‘논어’ 역시 철저히 ‘공자’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기술이며, 다만 그 저자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어’의 저자의 문제에 있어,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를 존중하여서 명확히 저자를 밝혔듯이, ‘논어’의 저자들 역시 ‘공자’를 존중하여서 실제의 저자를 밝히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는 단지 서양사회와 동양사회의 문화적 차이인 것으로 이해하면 족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가로운 호사가들은 온갖 사태가 유발되도록 갖은 말들을 지어내지만, 그런 것은 한없이 소모적인 한갓 허망한 지적 유희일 따름이다.
모름지기 ‘논어’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전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텍스트다. 그러다보니 ‘논어’는, 그것이 저술된 이후 가장 많은 주석과 해설이 덧붙여진 텍스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조선왕조 5백여 년 동안, 학문과 정치를 시도해볼 수 있는 천부적인 특혜를 보장받은 양반사대부로서, ‘논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은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더욱이 ‘논어’에 대한 ‘주자(朱子)’ 등의 유력한 주석이나 해설에 대한 이해 없이 과거시험에 급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그런 탓에 ‘논어’는, 그 어느 텍스트보다도 본래의 원전이 지니고 있는 본의가 그만큼 더 많이 훼손되고 왜곡되어버린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하물며 21세기에 이르러서라면, 기존의 무수한 주석이나 해설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논어’ 본래의 담담한 언어를 접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매가격 : 3,000 원
논어 2
도서정보 : 공자(탁양현 옮김) | 2018-07-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인간존재 본연의 감성 에세이
‘공자’의 삶을 대변하는 말은 ‘주유천하(周遊天下)’다. ‘주유천하’는 말 그대로 천하를 두루 여행했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여행자로서의 ‘공자’인 것이다.
필자도 대학원에서 중국철학을 전공 삼아 공부하면서, 중국의 전역을 몇 년에 걸쳐 다녀보았는데, 천하를 주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소나마 체감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 바로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다. 이는 ‘공자’가 70세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경지였다.
이것이야말로 ‘공자’의 철학사상을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어’ 전체를 집약하는 한 마디 역시 ‘종심소욕불유구’라고 할 것이다.
‘종심소욕(從心所慾)’은 자기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불유구(不踰矩)’는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해도 결코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혹자는 이러한 경지가 자칫 일상적인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 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억지로 억제하거나 억압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 지조차 잘 알지 못 하므로, 애당초 ‘종심소욕’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인간존재의 마음 안에는 온갖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서양의 심리학에 의한다면,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상태에서의 욕망을 지칭한다. 그러하다면 과연 그러한 욕망 자체가 죄다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불유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공자’를 성인이라면서 숭앙하는 것이다. ‘공자’는 자기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도에 전혀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종심소욕불유구’를 논할 만한 나이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청춘의 시절을 이미 살아낸 필자로서는, 이제 자꾸 중년의 삶에 대한 ‘공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공자’는 ‘논어’ 위정(爲政)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이 40에는 자기의 중심이 서서 현혹되지 않았고, 나이 50에는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그리고 ‘논어’ 양화(陽貨)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다.[年四十而見惡焉, 其終也已.]”
‘공자’에 따른다면, 필자의 나이쯤에는 이미 자기 삶의 중심을 갖고서 세상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이내 하늘이 나에게 명령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필자로서는, 이에 대해 마땅히 할 말이 없다. 여전히 온갖 세상사에 온통 휘둘리고만 있으며, 당최 몇 년이 흐른 후에도 천명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들만큼 잘 살아내지 못 하는 탓에, 늘 남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으니, 아무래도 끝장난 인생인 모양이다.
그렇더라도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만이, ‘공자’의 소중한 가르침에 그나마 다소라도 부응하는 일이리라.
중국인들에게 ‘공자’는 무한한 민족적 자긍심을 주는 존재다.
예컨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야구선수들을 활약상을 볼 때,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민족적인 자긍심을 느낄 것이다.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 강정호…. 이런 이름들을 들을 때면, 누구라도 그러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공자’를 프로야구선수와 비유한다는 것이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의 한국인들에게 ‘공자’의 존재는, 마치 현실세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문명에 가장 잘 적응하면서도 동시적으로 가장 잘 맞서는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처럼,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논어’를 독서하고 ‘공자’의 삶을 공부한다고 해서, 어떤 실제적인 이득이 발생할 리는 없다. 더욱이 현대처럼 첨예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목적하는 자본적 이익의 발생은 더욱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논어’를 읽는 일은, 삶의 무한한 자긍심을 일깨워 준다. 그것은 ‘논어’가 인류의 고전이 지닌 미학적 본질을 오롯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 현실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직업의 형태는 경비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경비(警備)는 말 그대로 ‘경계를 갖춘다’는 의미이며, 경계(警戒)라는 것은 무언가를 주의하여 살피며 돌보는 일이다. 그러니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경비하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저 그 대상이 다양할 따름이다.
예컨대, 부모는 자식을 경비한다. 선생은 학생을 경비한다. 경찰은 시민을 경비한다. 군인은 영토를 경비한다. 자본가는 자본을 경비한다. 사업가는 사업을 경비한다. 금융가는 금융을 경비한다. 정치가는 정치를 경비한다.
비단 직업적인 활동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재의 삶의 활동이라는 것이, 실상은 살피며 돌보는 일이 아닌 바가 없다.
그렇게 ‘공자’는 천하를 경비한 것이다. 다만, ‘공자’가 경비하는 대상이 일반적인 보통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계 자체였던 것이다.
인류사에 위인이나 성인으로서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 역시, ‘공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 등, 인류의 영원한 리더로서 자리매김 된 인물들은, 대체로 천하로서의 세계 그 자체를 경비한 인물들이다.
필자는, 살아온 날들을 회상할 때면, 필자보다 먼저 살아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바처럼, 지나온 삶에 대한 온갖 회한이 먼저 찾아든다.
그래서인지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회한으로나 기억되는 과거의 시절로, 굳이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별로 없다. 물론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과학기술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하튼 삶이란,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 교리적 바탕으로 삼는, 온갖 상상과 갖은 이론으로써 꾸며 둔 죽음 이후가 아니라, 다만 ‘지금 여기’의 일일 따름이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곧 삶 그 자체인 것이다.
‘공자’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 선진(先進)편에서, 죽음에 대해서 묻는 ‘계로(季路)’에게, “삶도 미처 알지 못 하는데,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未知生, 焉知死.]”고 대답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제, 삶의 청춘보다는 삶의 황혼이 좀 더 가까워진 나이가 되어버렸다. 어느새 세월이 그만큼 흘러버린 것이다.
어지간히 살아낸 이들이라면, 대부분은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다. 시나브로 세월이 금세 흘러버렸다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좋은 인연[善緣]’은 선연으로, ‘나쁜 인연[惡緣]’은 악연으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게도 되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자잘한 삶을 살아내는 서민대중으로서, 그나마 자잘한 ‘종심소욕불유구’를 실현하는 것이리라.
구매가격 : 3,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