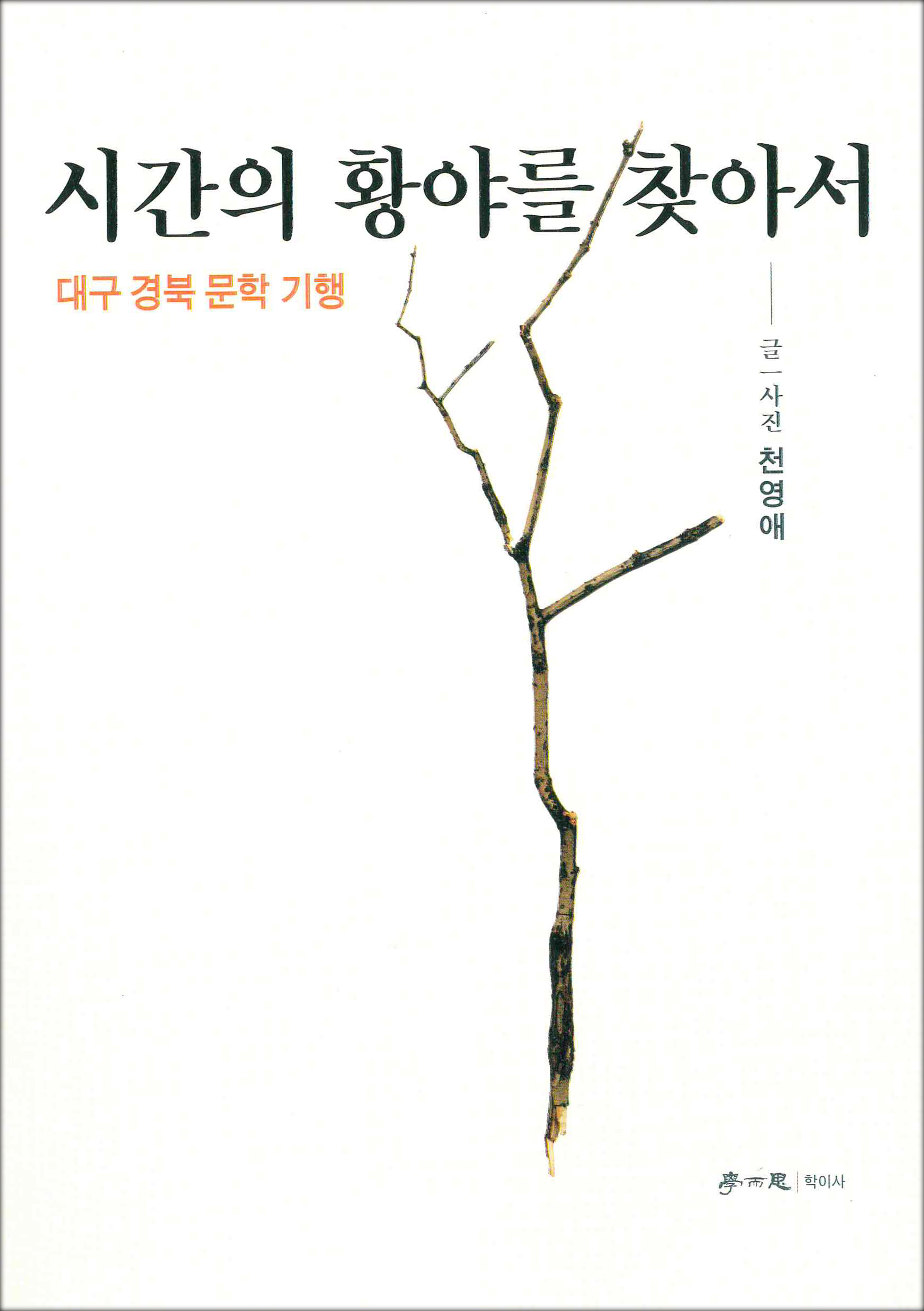운명의 황야를 떠도는 시간
떠돌이의 삶을 동경한 적이 있다. 나는 아마도 북방 유목민족의 후손이라서 한곳에 정주하고 사는 삶은 태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불현듯 낯선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볼 때마다 느껴지던 안도감은 얼마나 설렘을 동반하던가.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다닐 만큼 다녔다고 생각될 즈음, 낯익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숱한 세월 동안 나는 과일의 단단한 껍질을 겨우 밟고 다니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육의 속살은 내가 다녔던 길에서 비켜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길을 오르고 올라 당도한 영양의 황씨부인당이나 봉감모전 오층석탑은 내 오랜 방랑의 길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렸다. 평생 단 한 번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았던 문학작품의 문장이 주저앉은 가슴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처음으로 문학의 길을 더듬어 보자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문학은 곱게 화장한 얼굴을 드러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황씨부인당의 거칠고 익숙하지 않은 신당 공간이나, 어느 아득한 세월에 쌓아 올렸을지 모르는 석탑의 민낯에 있을 것이었다.
지금까지 문학 답사를 다녔던 그 많은 곳들은 돌이켜 보면 잘 다듬어진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처럼 인위적으로 공간을 조성한 헛된 곳들이었다. 작품 속의 가슴 저미던 문장들은 깊숙이 숨겨진 곳, 구태여 찾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곳들에 그 행간을 숨기고 있었다.
한 곳을 다녀오면 다음 곳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가지 않은 많은 길이 은빛 물결처럼 일렁거렸다. 신기루처럼 떠오르던 상상 속의 길에 문장이 춤을 추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다시 지난 수십 년간 내 문학의 행적을 되돌아보아야 했고, 그 행적이 쓰라린 날은 문장이 흘러가는 공간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다.
길 위에 서 있는 동안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동행이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문학은 결국 혼자서 하는 고독한 작업이라는 생각은 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행이 있다 해도 보는 것이 다를 것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은 다를 터였다.
그러다가 나는 문득, 병이 났다. 가을이면 다시 가고자 했던 길들이 아른거렸지만 나는 병 앞에 주저앉아야 했다. 시간과 공간은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임에도 나는 달려가기는커녕 그 공간과 시간을 만나기 위해 읽으려고 했던 책조차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운명이라는 중후한 언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운명이 나를 다시 길 위에 세운다면 나는 시간을 거슬러 그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나의 역마는 여기서 막을 내릴 것이다. 운명이라는 언어의 막막함 앞에서 나는 천천히 미래의 시간을 그려본다. 과거의 시간이 미래의 시간과 중첩되어 내가 함부로 다스렸던 현재의 시간이 삭아 내렸다. 현재는 과거의 시간이었고, 과거의 시간을 천천히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게 현재도 없을 터이다.
글을 쓰기 위해 갔던 곳을 또 다녀오기를 거듭했지만 갈 때마다 그곳은 내가 다녀왔던 그곳이 아니었다. 시간이 변하고 있으니 공간도 변하고, 살아있는 것들도 변해갔다. 시간의 엄중함은 막막한 황야처럼 때마다 다르게 다가왔다.
전부 안다고 생각했던 문학작품과 작가와 그들이 살았던 공간은 알고 보니 전혀 모르는 곳들이었다. 수없이 가봤던 곳들은 처음 가보는 곳처럼 낯설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십 년이 넘도록 한 번도 문학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글자를 처음 익혔던 다섯 살 무렵부터 나는 책을 붙들고 살았고, 이 글을 쓰는 내내 내가 읽었던 책의 문장들이 거짓말처럼 흘러나왔다.
운명이 나를 다시 되살려 준다면 이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다만 운명에 내 삶을 맡길 뿐이다.
여전히 나의 글을 기다려주는 학이사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지켜보고 기다리는 출판사가 있어 글쓰기는 믿음이 된다. 햇살이 좋은 날이면 천천히 걸어 학이사에 가는 그런 산책을 오래 하고 싶다.
2020년 10월
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