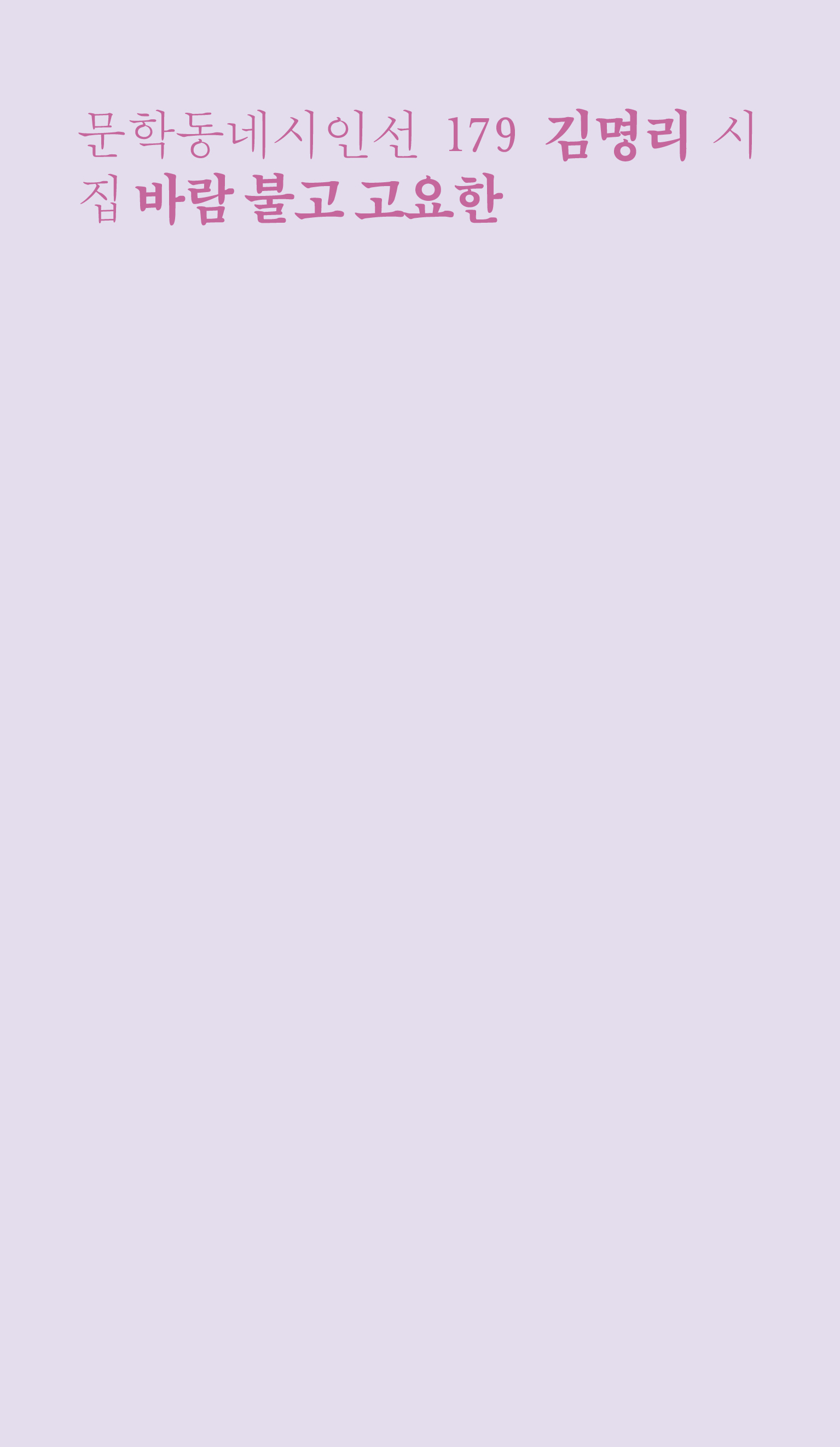“이대로 죽음이
삶을 배웅 나와도 좋겠구나 싶은”
정련된 시적 세공으로 빚어낸 생의 아름다움
시력 40년, 김명리 시의 정수
문학동네시인선 179번으로 김명리 시인의 신작 시집을 펴낸다. 1983년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한 이래, 정갈하게 다듬은 시어로 존재의 쓸쓸함과 비극적 아름다움을 노래해온 시인의 여섯번째 시집이다. “서정적이고 예민하고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는”(문태준 시인) 시들을 꾸준히 발표하며 오랜 기간 독자들과 호흡해온 김명리는 이번 시집을 통해 죽은 줄 알았던 모과나무에서 어른거리는 “연둣빛”(「바람 불고 고요한」)으로 표상되는 소생의 기운을 느끼고, 그러한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깊이를 “풀의 무게란/ 잠시 번성했던 초록의 무게”(「풀의 무게」)라고 성찰한다.
문학평론가 정과리는 해설에서 이 시집을 “한국시사에서 가장 굵은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적 서정시형을 넘어서 가려는 실천”이라고 말한다. 시적 대상을 향한 기다림과 한(恨)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처방전이 없는 삶”(「삶이라는 극약」)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시인의 “뜨겁게 생동”하는 시편들은 “기다림”이라는 태도를 “발견의 기쁨으로 만드는 현장”인 동시에 독자들에게 전하는 시인의 진실한 편지이며, 시력 40년에 다다른 한 예술가가 길어올린 예술세계 그 자체이다.
“김명리의 시에서 느껴지는 가장 직접적인 풍미는 고급스러움이다. 돌로 치면 세공된 ‘보석’이고, 옷으로 치면 ‘오트 쿠튀르’이며, 나무로 치면 ‘사군자’이다. 일제강점기의 미술평론가 김용준의 명명을 빌리자면 ‘고아미(高雅美)’라고 부름직한, 절도와 우아함으로 이루어진 품격이라 할 것이다.” _정과리, 해설에서
시집은 총 네 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자연물을 통해 느끼는 생명의 작은 기미들과 인간 삶의 본질적인 쓸쓸함을, 2부는 어머니라는 소중한 대상을, 3부는 우리 주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몸을 지닌 동물들을 바라본다. 4부는 이 모든 시상을 아우르는 작품들로 존재를 향한 연민어린 시선을 보여준다.
죽은 줄 알고 베어내려던
마당의 모과나무에
어느 날인가부터 연둣빛 어른거린다
얼마나 먼 곳에서 걸어왔는지
잎새들 초록으로 건너가는 동안
꽃 한 송이 내보이지 않는다
모과나무 아래 서 있을 때면
아픈 사람의 머리맡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적막이 또 한 채 늘었어요
이대로 죽음이
삶을 배웅 나와도 좋겠구나 싶은
바람 불고 고요한 봄 마당
_「바람 불고 고요한」 전문
시집의 핵심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표제시 「바람 불고 고요한」은 스러져가는 삶에 집착하지 않고 그 무상성을 온전한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여 마침내는 “죽음”이 “삶을 배웅 나와도 좋겠구나”라고 노래하는 시이다. 김명리의 이러한 시적 태도는 다른 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저녁해의 불꽃 이내 흩어지고
서둘러 잎 내고 꽃 피우던 여름꽃 진다
체로금풍의 시절이 머지않았으니
여름의 핏자국들 이내 희미해지리
우리도 끝내 자욱이 돌아서리라
_「파위교」 부분
애도가 종잇장처럼
가벼워지는 봄날 오후
만곡처럼 휩쓸리는
새의 영원을
햇빛은 지나가기만 할 뿐
바람은 스쳐지나가기만 할 뿐
_「꽃잎 너머」 부분
한편, 「김치박국 끓이는 봄 저녁」은 시집 가운데 오감을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는 시로, 발표 당시 눈 밝은 시인들과 독자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회자된 작품이다.
기억에도 분명
맛의 꽃봉오리, 미뢰가 있다
건멸치 서너 마리로 어림밑간 잡아
신김치 쑹덩쑹덩 썰어 넣고 김칫국물 넉넉히 붓고
식은밥 한 덩이로 뭉근히 끓여내는
어머니 생시 좋아하시던 김치박국
신산하지만 서럽지는 않지
이 골목 저 골목 퍼져나가던 가난의 맛,
기억의 피댓줄 비릿하게 단단히 휘감아들이는 맛
반공(半空)의 어머니도 한술 드셔보시라
뜰채로 건져올리는 삼월 봄하늘
봄 나뭇가지 연둣빛 우듬지마다
천둥처럼 퍼부어지는 저 붉은 꽃물 한 삽!
_「김치박국 끓이는 봄 저녁」 전문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김치박국을 끓이며, “봄 나뭇가지 연둣빛 우듬지”처럼 푸르고 “천둥처럼” 활달하며 “붉은 꽃물”처럼 찬란했던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이야기. “신산하지만 서럽지는” 않았던 가난의 시절, 어떤 음식보다 감각을 자극하는 김치박국은 그 자체로 육박해오는 살아 있음의 생생한 증언과도 같다. 김치박국을 통해 존재의 근원으로 내려가 생의 “피댓줄”을 “휘감아들이는” 이 시는 독자들에게 울림 있는 위로를 선사할 것이다.